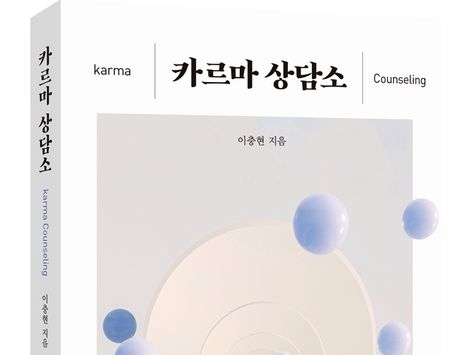(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베르됭 전투는 세계 1차대전 당시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 사이에서 참호전 형태로 벌어졌으며 최소 70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 영국의 기자이자 전기 작가인 앨리스터 혼이 베르됭 전투를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 번역출간됐다.
독일은 프랑스의 병력과 물자를 소모한 후 서부전선을 돌파해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 그러나 10개월 뒤 독일군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프랑스 베르됭에서 물러났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흐름도 바뀌었다.
책은 무감각해질 정도로 만연한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싸운 병사들의 의지, 야전 지휘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 일기 변화, 병사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양국 군 지도부의 무능과 내부 갈등까지 전투의 성패를 가른 모든 요인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보여준다.
베르됭 전투는 '참호전'의 전형이었다. 기관총과 대포 공격을 피하기 위해 병사들은 깊숙이 참호를 파고 들어갔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지에서 얼음물을 퍼내며 적진으로 진격하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 잠든 얼굴 위로 뛰어다니는 쥐와 벼룩, 이가 병사들을 괴롭혔다.
병사들은 대포와 싸웠다. 돌파를 위해 달려 나간 보병들은 적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쏟아지는 포탄에 무참히 쓰러졌다. 때로 아군 포대에서 쏜 포탄에 맞아 죽기도 했다. 급조된 참호 벽에 죽은 동료의 머리와 팔다리가 박혀 있었고, 포탄 구덩이에는 시체들이 떠다녔다.
베르됭 전투는 지휘관의 냉혹함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인의 전략은 '말려 죽이기'였고, 프랑스군 총사령관 조프르의 신조는 '죽을 때까지 공격하기'였다. 결국 독일군과 프랑스군 모두 무수한 죽음을 양산했고 베르됭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박살난 무기, 희게 변한 유골이 쌓인 '쓰레기 더미'가 됐다.
베르됭 전투는 소모전의 전형이었다. 연합군은 '총알받이'가 될 병사의 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쪽이 한 사람씩 병력을 잃는 방법을 쓰면 결국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계산했다. 결국 베르됭 전투는 역사상 단위 면적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전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다.
◇베르됭 전투/ 앨리스터 혼 지음/ 조행복 옮김/ 교양인/ 2만80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