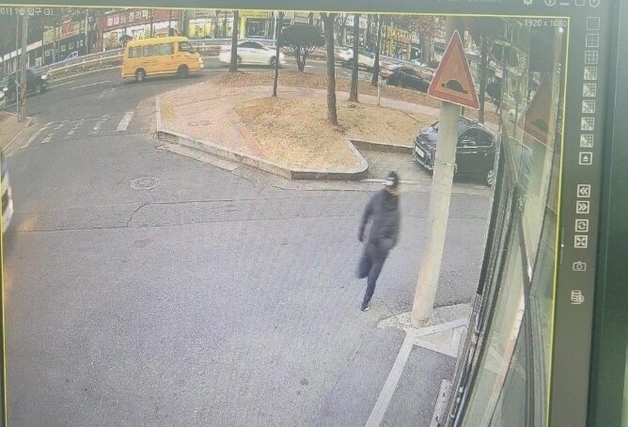세계최초 국가단위 무작위 '기후 배심원단' 뽑는다
기후위, 국회서 시민기후회의 운영방향 첫 공개
학습·토론 거쳐 권고안 도출…정부 수용여부·후속이행 점검 '숙제'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민 누구나 '기후시민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산업 전환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로 구성되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나온 권고안은 정부가 정책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동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런 향후 운영 방향을 처음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 변호사' 출신 박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후시민회의는 법원의 배심원단처럼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참여자를 구성하고, 특정 연령대나 집단이 부족할 경우 별도 보완 절차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참여자들은 의제 학습과 숙의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가 기후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국회는 기후시민회의를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과 연결되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시민의 권고가 실제 정책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시민 숙의의 핵심은 앞단의 학습 설계"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는 시민 구성 기준과 정책 반영 장치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성별·연령·지역만으로는 사회적 대표성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며 "직업 구조나 세대 내부 격차까지 고려해야 시민회의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와 그 사유, 후속 이행 상황을 설명·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찬국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치적 책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가 시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책임 구조가 전제돼 있다"며 "숙의 결과의 정당성을 행정부 책임성과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지낸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기후시민회의를 사회적 갈등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며 "투명한 논의와 신뢰 형성이 없다면 정책 추진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제의 성격과 갈등 수준에 따라 논의 기간과 방식에 유연성을 두는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시민 숙의 기반 기후정책 모델이 'K-기후회의'로 정착되면 한국형 거버넌스를 하나의 표준으로 만들어 '동아시아 시민 기후회의'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시민회의를 상설 제도로 정착시켜 기후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민 권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표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설계가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