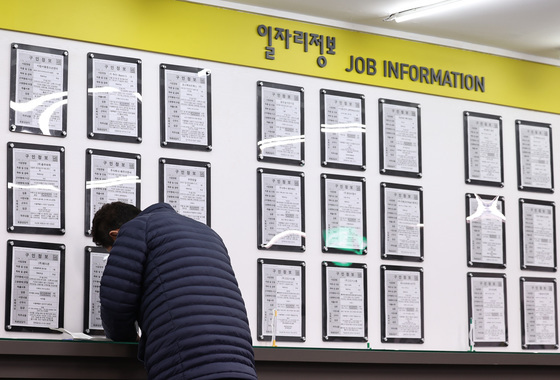SK하닉-삼전 성과급 다른 대법 판단…'취업규칙 명시·정기성' 갈랐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 여부 등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임금성 부정"
- 한수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송송이 기자 =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사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두 사건에서 원고들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로 결론을 달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rofit shaarign·P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다만 지급 기준이나 한도, 지급률, 지급 조건 등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가 있던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노사 합의안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 씨와 B 씨는 "퇴직금 산정에 PI와 PS가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그러나 1·2심은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PI, PS의 평균임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결국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두 사건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동일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봤고,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인 PI, PS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먼저 두 사건의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명시돼 있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마련돼 있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에는 PI와 PS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의 지급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장기간 생산직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PI와 PS를 지급했는데 2001년과 2009년에는 성과급 지급 여부에 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고, B 씨 등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노사 합의 적용이 아니었는데도 사측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SK하이닉스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법은 "PI와 PS를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대법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SK하이닉스의 PI와 PS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도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 대법은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며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 전문가들도 대법의 판단 기준은 같았으나 사실관계를 이루는 두 회사의 성과급의 특징이 달라 각각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 이유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임금성 요건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건과 SK하이닉스 사건에는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SK하이닉스 사건에서의 성과급은 지급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삼성전자 사건에서의 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것에서부터 (결론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주된 사실관계, 인과관계 부분에서 두 사건에 차이가 있었다"며 "겉보기에는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급의 성격이 다른 만큼 대법원의 결론도 달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