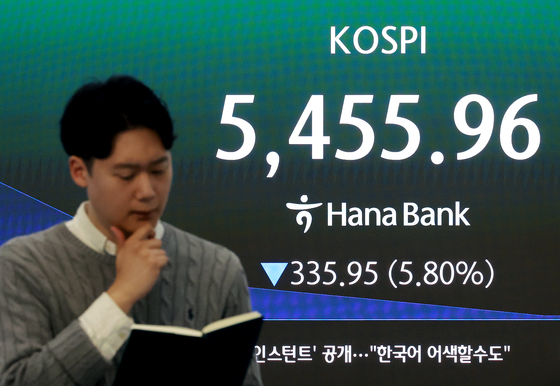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가속…교육 사각지대·교원 쏠림 우려
'통합교육감' 가닥…관할범위 넓어져 농촌 소외도
교육 고려한 '특례' 필요…교육계 의견 반영돼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140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교육청과 학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전남도와 시·도 교육청은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오는 2월 내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충남도 여당을 중심으로 2월 설 전 관련법 통과를 목표로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선 두 지역 모두 '통합교육감'을 두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행정통합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 교육 의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이 향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관할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육현안에 대응하는 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기초단체장까지 뽑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감은 광역 단위로 선출되는데, 지역이 통합될 경우 교육감 1명의 관할 범위가 더욱 넓어져 지역 단위의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13일 "대전과 충남은 인접해 있으나 교육 여건과 과제가 확연히 달라 상이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의 현안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교육청이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원청은 교육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사무를 분장 받아 일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관할 범위가 넓어질 경우 교원의 지역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충남과 대전교육청 소속 교사가 모두 도시 근무를 선호하면서 소멸 위기 지역인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는 학생, 학부모, 학교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이 팀장은 "교육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청의 운영 방식, 인사, 학교나 학생에 대한 지원이 패키지로 묶인 특례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논의에 보다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통합은 절차적 흠결은 물론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향후 논의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