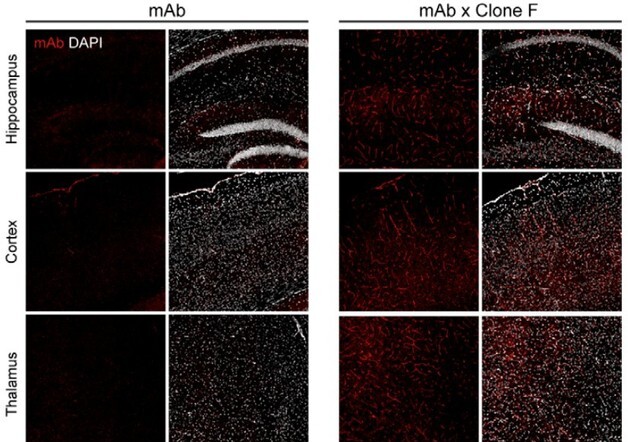엄마는 멸종위기 보호종이자 전염병 매개체…딸의 선택은
[신간] '다나'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박서영 작가가 첫 장편소설 '다나'를 펴냈다.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사람은 아닌 짐승 '다나'에게서 태어난 주인공이 탈출한 엄마를 찾는 이야기다.
경북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 한 마리가 탈출했다. 주인공은 뉴스를 듣자마자 그 동물이 자기 엄마라고 알아차린다. 엄마의 이름은 '다나'다.
'다나'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됐지만, 끝내 '사람은 아닌 짐승'으로 분류된다. 멸종 위기종이면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존재로도 찍힌다. 한쪽에서는 지켜야 할 '보호종'이고, 다른 쪽에서는 없애야 할 '침입종'이 된다.
주인공은 그런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러졌다. 주인공은 "나는 다나의 딸이지만 다나와 같은 짐승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선을 긋는다. 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목덜미의 털을 깎는 장면도 나온다.
주인공의 생계는 벌목이다. 나무를 베어 돈을 번다. 나이 서른, 여성, 그리고 어눌한 발음까지 겹치며 주인공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티 안 나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려 한다. 소설은 이런 숨는 기술을 통해, 차별이 어떻게 일상으로 파고드는지 보여 준다.
소설 속에서 조 단장의 일은 '산을 지키는 것'이다. 늙거나 병든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는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다나'는 산을 병들게 하는 적으로 규정된다. 주인공에게도 엄마는 적이다. 증오의 크기는 한때 품었던 사랑의 크기와 같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단순히 '엄마 찾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나들이 왜 여러 나라로 수입됐는지, 왜 주로 암컷이 포획됐는지, 작은 상자에 갇혀 이동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보호와 관리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독자가 따져 보게 만든다.
소설은 총을 중요한 도구로 놓는다. 주인공은 "총은 위계를 뒤집는다"고 규정한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가 뒤집힌다는 뜻이다. 이 장면은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잔인한지, 동시에 얼마나 '사람다운 방식'으로 포장되는지 드러낸다.
소설 '다나'는 개발주의, 이주와 외래종에 대한 공포, 동물권과 성폭력, 산림 정책과 비정규 노동 같은 여러 문제를 한 공간에 밀집시킨다.
△ 다나/ 박서영 지음/ 민음사/ 1만 5000원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