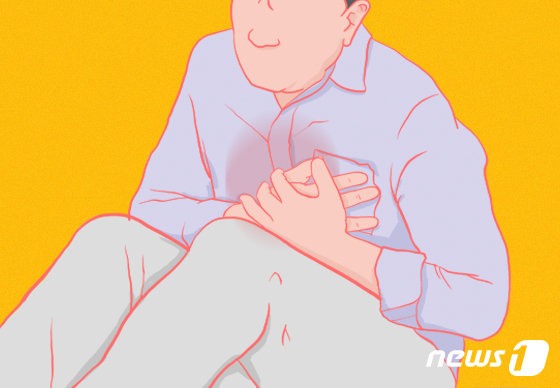[팀장칼럼] AI의 목소리는 선명한데…권리는 흐릿
-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ChatGPT야 겨울 감성에 어울리는 발라드를 만들 거야, C 키로 코드 만들어줘"
인간은 점점 더 빠르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을 이뤄냈다. 악보를 그려가며 작곡하던 시절에서 컴퓨터로 멜로디를 찍는 미디 작업, 그리고 이제는 AI(인공지능)를 도구로 활용한다.
AI의 등장과 함께 '아티스트'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 전공자와 '음악 좀 한다'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작곡을 할 수 있게 됐다. AI는 가이드 멜로디, 코드 진행, 보컬 모델링까지 척척 해낸다. 사람은 AI가 만든 틀 위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곡·수정·감정선 조절로 음악을 완성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저작권 체계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곡 등록 시 AI 활용 여부를 체크하도록 규정했지만, 'AI를 어느 정도 쓰면 창작성이 부정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 AI가 만든 골격 위에 사람이 감정선을 입혔다면 이 곡은 누구의 창작물인가. 실무자들은 "AI를 쓰지 말라는 말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인간 단독 창작'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즉,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서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보니, 기술과 제도의 역설 속에서 음악계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백이 AI 커버 곡 영역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정산은 작동하지 않고,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해도 이를 보호하거나 보상할 제도는 없다. AI 커버는 지금 사실상 '정산 0원'의 무국적 지대에 놓여 있다.
이 공백은 업계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가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본뜬 AI 보이스 모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 수 없다. 대중 역시 AI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돌아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AI가 음악 제작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때인 만큼 기술을 배제하는 것도, 위협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AI와 인간의 창작이 공존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기다. 창작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권리 충돌과 창작자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작곡가 김형석과 더 크로스 멤버인 이시하 역시 이 지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형석은 "AI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협회가 먼저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AI 활용 비율, 원곡자와의 정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향후 발전된 기술 아래 우리 모두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하 역시 "AI 보상금 연금 도입, AI 기반 업무 시스템 확립,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으로 AI 크리에이터와 음악 작가를 구분하는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음악은 언제나 시대의 기술과 함께 진화해 왔다. 그러나 그 진화가 창작자의 이름을 희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 AI가 만든 목소리가 아무리 선명해져도, 그 목소리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지는 인간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AI의 시대, 이제는 기술보다 '권리의 선명함'이 필요한 때다.
hmh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