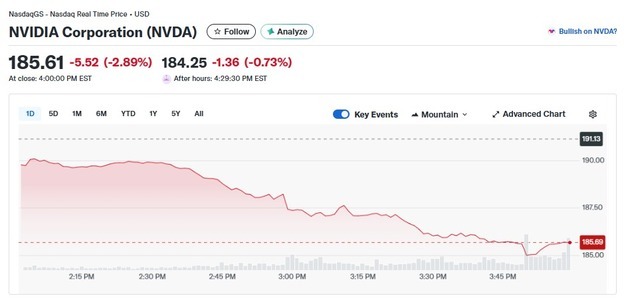[기자의눈] 컨트롤타워 없는 K-바이오, 이제는 미룰 수 없다
본격화하는 글로벌 바이오 전쟁 속 속도 맞출 '통합' 시스템 시급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매년 혁신성장을 내세워 R&D 예산을 늘려왔지만, 반복되는 지적에도 총괄할 구심점은 여전히 없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K-바이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정책은 많은데 방향이 없다"는 업계의 푸념이 이어지는 이유다.
현재 한국은 임상 승인과 허가, 보험 등재, 수출 지원이 부처별로 따로 움직여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범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도 회의체에 가깝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기회 상실'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인허가, 임상, 기술이전 협상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각 부처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글로벌 시장에선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도 우리과 같을까? 미국은 백악관 산하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위원회'를, 영국과 프랑스는 총리실 직속 바이오혁신청을 운영하며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일원화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이 규제·임상·수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K-바이오의 위상은 높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국내 신약 개발사들도 해외 임상과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회의 중심의 위원회가 아니라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산업 전략과 R&D, 인허가, 약가정책을 한 축에서 통합 관리할 상설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시장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이미 속도전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혁신성장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강조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를 관성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또다시 "가능성은 있었지만, 시스템이 없었다"는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