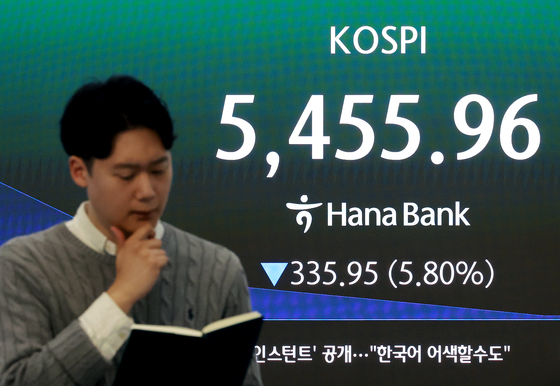[기자의 눈] 10년 뒤 아기를 받아줄 의사는 어디 있을까
고령산모, 고위험 출산 증가하는데 분만과 기피 가속
불가항력 분만사고 책임 완화 등 의사가 안심할 환경 구축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우리나라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이른둥이다.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다태아 출산이 늘어난 탓이다.
산모 10명 가운데 3명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로 1995년 4.8%에 불과하던 비중이 지난해에는 35.9%까지 치솟았다. 고령 임신이 흔해진 만큼 위험 역시 커지면서 다태아의 70%가 조산아로 태어난다. 2023년 우리나라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 2위,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세계 1위다. 산모와 아이, 분만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은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분만과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기피 과'였다. 수가 보전이 어렵고 업무 강도는 높아서다. 정부가 나서서 수가 보전을 약속했지만, 문제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다.
무엇보다 의료 현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건 '의료 소송'이다. 뇌성마비, 뇌 손상 같은 사건에서 배상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 민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지니 의사들은 늘 피고석을 상상하며 진료한다. 최근에는 출산 직후 아기가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건으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불구속 기소됐고 현장은 술렁였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기자에게 "총알을 피할 수 있느냐"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 결과는 뻔하다. 지역에서는 아이를 받아줄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남은 의사들은 수술실 대신 수사기관과 재판장을 오가며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의사들의 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이미 60대 이상이다. 30대 이하는 11%에 불과하다.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0년 뒤에도 아이는 태어난다. 하지만 그 아이를 받아줄 의사가 과연 곁에 남아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줄이고 국가가 배상에 나서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분만실에 설 수 있어야, 산모와 아이도 안전하다.
출산율 반등을 외치는 사회가 정작 분만 현장을 방치한다면, 10년 뒤 한국은 아이 울음소리보다 의사 부재의 공백을 먼저 맞게 될 것이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