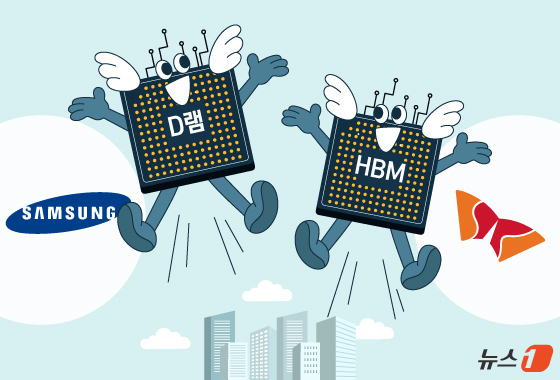"보리 홉 물외 첨가물은 가짜 맥주"…獨 '순수령' 500년
-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독일이 올해 '맥주 순수령(purity law)' 선포 500주년을 맞았다. 법령이 스타일을 망치고 있다는 수제맥주(craft beer) 제조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독일 맥주 양조업자들은 수백년 된 순수령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어로 '다스 라인하이츠게보트(das Reinheitsgebot)'로 불리는 맥주 순수령은 맥주를 보리와 홉, 물만으로 제조하도록 한 것이다. 효모(yeast)는 이후에 가능 원료로 추가됐다.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안전법 중 하나다.
순수령은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4세가 1615년 4월 23일 맥주 소비가 늘면서 톱밥과 검댕, 독초 등이 섞이는 것을 우려해 공포했다. 맥주의 품질을 개선해 조세 수입을 늘리고 밀이나 호밀의 사용을 금지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현재 이 법령은 기사와 성(城)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 유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세계에서 라거와 필스, 바이스비어 등 독일 맥주의 셀링포인트(상품 판매시 가장 중요한 장점)가 됐다는 것이 양조업자들의 설명이다.
베를린 소재 독일 양조협회 회장 한스-게오르그 엘리스는 "해외의 다른 맥주 양조업자들과 달리, 독일은 인공 향과 효소,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를린공대 산하 국가식품연구소의 맥주 전문가 프랑크-유르겐 메트너는 단순화한 맥주 제조법은 오가닉(유기농) 및 건강지향(wholesome) 식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현재의 추세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음식물을 중시하는 시대에, 라인하이츠게보트에 따라 제조된 맥주의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바이에른주(州) 잉골슈타트에서 4월 22일 순수령 공포를 기념하지만 독일 전역에서는 맥주의 날인 4월 23일 법령 공포 500년을 축하한다. 바이에른 바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 닉 자닉은 "뮌헨 맥주가 너무 좋다. 이 보다 좋은 맥주는 없다"고 추켜세웠다.
심지어 시골에서에서도 수세기 동안 자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독일에는 3500개의 양조장이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15억ℓ에 달한다. 다만, 맥주 소비량은 1970년대 1인당 연간 150ℓ에서 현재는 107ℓ로 감소했다.
대다수 독일 맥주 양조업자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돼왔고 1907년에는 제국법이 된 '맥주 순수령'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맥주 전문가들은 순수령 뒤에 숨겨진 의도는 맥주만큼 항상 순수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해외 경쟁자들에게 맞서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1950년대까지 바이에른은 다른 지역에서의 맥주 수입을 금지했다. 또 독일은 외산 맥주들에 대해 1990년까지 수입을 막았다. 유럽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서야 문호를 개방했다.
베를린공대의 메트너는 "라인하이츠게보트는 1993년까지 보호주의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연간 맥주 소비에서 외산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이다.
맥주 순수령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신세대 양조업자들이 맥주에 꿀과 크랜베리 등을 넣으려고 하지만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대형 양조업체 호프브레이 뮌헨의 홍보 담당자 스테판 헴플은 "보다 과감하게 실험하고 싶어하는 소규모 양조장과 크라프트 비어 양조업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크라프트와 부티크 맥주 업체들은 독일에서 맥주 양조가 가능하지만 제품 라벨에는 "혼합 맥주 음료(mixed beer beverages)"라고 표기해야 한다.
allday3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