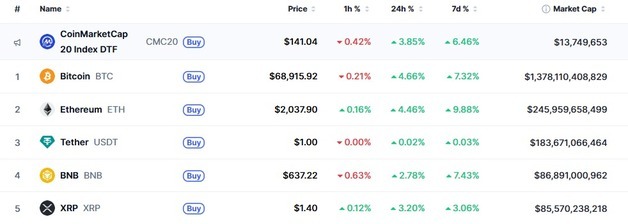[기자의 눈] 죽음이 순교로 포장될 때, 사회는 병든다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최근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 인물 중 하나였던 찰리 커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극우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커크는 미국 보수 청년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청년 보수층을 결집한 상징적 인물이다. 한국 또한 일부 보수 집회 세력들이 커크의 이름을 거론하며 '순교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정치 테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그 죽음이 어떻게 소비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적을 미워하며, 그들이 잘 되길 원치 않는다…나는 내 적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파를 겨냥하는 데 활용한다. 해외 극우 진영 역시 그의 죽음을 정치적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순교자 정치'다.
죽음을 신화화해 집단을 결집하는 방식은 낯설지 않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 전사자를 미화하며 더 많은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개인의 죽음은 '성스러운 희생'으로 포장됐지만, 결국 사회 전체를 더 큰 파괴와 희생으로 몰아넣었다. 오늘날 커크의 죽음을 둘러싼 과도한 신격화 역시 같은 함정을 내포한다. 커크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분노로 전환되면서 그 감정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 일대 등에서 벌어진 '반중 집회'는 이를 보여준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찰리 커크다"라는 구호 뒤에는 "중국인 추방", "윤석열 어게인"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뒤따랐다. 이들의 극단적 메시지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증폭됐다. 인근 상인 등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은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집회는 곧바로 장소를 바꿔 이어졌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파시즘이 확산한 배경에는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그리고 '적'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있었다. 지금 한국 극우 집회 역시 뚜렷한 해법보다는 '공통의 적'을 설정하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 패턴을 답습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집회 메시지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 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혐오와 적대다. 추모가 분열을 낳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에 가깝다.
죽음을 극단적 메시지를 표출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보수든 진보든 성향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죽음을 '순교'로, 순교를 '결집의 구호'로 바꿔 혐오나 차별의 메시지를 내뱉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은 명백하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