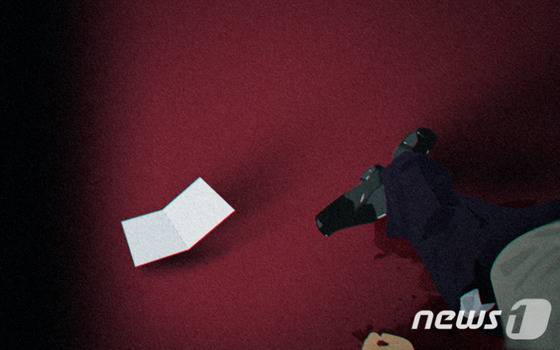새해 쫓겨나는 '양동 쪽방촌'…건설사가 100억 들여 사들여
개발 계획에 쪽방 건물 줄줄이 매각…예비퇴거조치 이뤄져
'순환형 공공개발'이란 대안 있어…"공공이 적극 나서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달 초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양동) 쪽방촌 주민인 강현수씨(가명·63)는 집주인에게 '집을 팔 것 같으니 방을 뺄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름부터 주변 쪽방촌 건물들이 하나둘 팔려나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봐왔는데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현수씨 옆집 쪽방에서 살던 이웃들도 지난해 전부 방을 비워야 했다. 집주인은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 수리를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건물 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수씨는 건물주가 집을 팔기 위해 집을 수리를 핑계로 거주민들을 내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방을 빼 달라는 소리에 항의하자 집주인은 한동안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더이상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씨는 불안함 마음에 이사 갈 곳을 구하고 있다. "없는 사람들 어디로 나가야 할지 한심스럽다"며 현수씨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양동 쪽방촌 재개발에 쫓겨나는 주민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0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동은 서울역 맞은편 남대문경찰서 뒤편 일대를 부르는 명칭이었으나 현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편입됐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1978년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1년만에 재개발이 본격화됐다.
이번 정비계획에서 '소단위 정비지구'로 지정된 양동 11지구와 '소단위 관리지구'로 지정된 양동 12지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쪽방촌 밀집지역이다. 애초에 서울시는 이 쪽방촌 구역에 공원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문제는 재개발의 주체가 민간으로 정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시민단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재정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사이 쪽방촌 주민들은 개발을 앞두고 예비퇴거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몇몇 쪽방 건물이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양동 11, 12지구 내 건물 곳곳에 건물 폐쇄를 알리는 알림문이 붙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12지구의 경우 13개의 건물 중 3개만 쪽방으로 남았다"라며 11지구의 6개 쪽방 건물 중에서도 1개 동은 변경을 이유로 폐쇄됐고 나머지 건물들도 일부 층이 폐쇄돼 거주하던 사람들이 내쫓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개발을 앞두고 400여명에 달하던 11, 12지구 거주민들은 최근 200여명 정도로 줄었다.
특히 이 활동가는 쪽방 중에는 서울시가 소유주와 임대차 관계를 맺고 저렴한 가격에 쪽방을 다시 전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면 공공이 나서 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사고 있나?
서울시가 지난 2019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양동 11, 12구역 거주자는 모두 471명이었다. 53.2%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이중에 40%는 65세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69.5만원으로 이중 약 35%인 24.6만원을 쪽방 임대료로 사용했다.
1평 남짓한 방에 24만~25만원의 월세는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의 평당 월세보다 비싼 가격이다. 그럼에도 쪽방촌을 찾는 이유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이다. 쪽방 주민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구하기 어렵다.
쪽방이 아니면 방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 서울 시내 전체 쪽방촌 건물 중 75.1%에는 취사장이 없으며 세면장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비율도 31.4%에 달했다. 또 15.9%는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쪽방 건물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외지인들이다. 건물 소유주들은 임차인들에게 건물을 제공해 세를 받고 이 임차인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다시 쪽방을 전대하는 방식이다. 20세대가 입주해 있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인 관리자가 가져가는 한달 수익은 500만원대다. 최저생활층인 쪽방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규모 대비 높은 단가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착취'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최근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쪽방의 소유주들이 바뀌고 있다. 양쪽 쪽방촌에서 등기가 확인되는 쪽방 건물, 토지 18곳 중 11곳이 2019년과 지난해 사이 부분·전부 매각됐다. 11지구는 6개의 쪽방 건물과 부지 중 정부에 압류된 2곳을 빼고 4곳이 모두 매각됐으며 12지구의 경우 12개의 쪽방 건물, 부지 중에 8곳(전부 6곳, 부분 2곳)이 이 기간에 팔려나갔다.
특이한 점은 건물을 매입한 이들이 대부분 법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양동 지구의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 9개 중 7개는 모두 'A건설사'의 계열사이거나 관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 건설사인 A사는 직접 양동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A사와 그 계열사 관계사가 양동 지구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100억원이 넘는다.
◇'공공개발' 대안있지만 민간에 미루는 관행이 문제
11지구와 12지구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1지구는 곧 본격적인 계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중구청과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사업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주체들은 개발계획을 마련할 때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제출되기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예비퇴거조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현 활동가는 건물 소유주들이 개발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관리자들을 동원, 퇴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일이 현재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있던 사람들, 권리자들을 내보내고 무권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주민들의 퇴거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없다"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중구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사업 주체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이 확정되면 가급적 쪽방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지금이라도 민간이 아니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다른 답변이 나오진 않고 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 차원에서 개발이 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부지를 수용하고 공공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일대의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로 인해 본래 주거지를 잃는 쪽방주민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개발이 완료되면 이들이 살던 지역에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영등포와 같은 '순환형 공공개발' 방식은 대전역, 부산 동구 쪽방촌 재개발에도 적용됐지만 이후에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공공목적의 개발임에도 가급적 개발을 민간이 추진하게 하고 공공의 개입을 미루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의 경우에도 민간 주도의 개발이 좌초되자 정부가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