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기념식에 '녹슨 지구'…새 대통령, 선언 아닌 실행을 [황덕현의 기후 한 편]
지구환경 형상화한 새집 전시…파괴된 지구 회복 촉구 암시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귀포=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이 열린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출입구 앞엔 한 무더기 고철들이 쌓여 있다. 보기 좋게 도색된 것도 있지만 녹슬고 뒤틀린 철판도 보인다. 종이책을 펼쳐 쌓아둔 구조물도 눈에 띈다. 얼핏 보면 조잡하지만, 모두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든 조형물이다. 주제는 '새장'(Bird house), 지구환경을 상징한다.
철제 구조물이 겹겹이 교차한 작품은 피터 아이젠먼이 만든 새집이다. 큰 철장을 다층의 칸으로 구획하면서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새들이 그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머무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 속에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는 개념을 표현했다.
아나리사 도미노니는 가지를 엮어 만든 구형의 새집을 제안했다. 단단하고 균일한 외형이 아니라 자연의 뿌리처럼 얽힌 곡선 구조로, 그 안에 식물과 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이 퍼지며 전체를 덮게 된다.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보인다.
크리스 랭턴의 새집은 펼쳐진 책의 형태다. 실제 종이 재질에 텍스트와 지도, 조류 사진 등이 인쇄돼 있어, 새가 둥지를 트는 집이자 인간의 지식과 환경 의식이 깃든 공간이기도 하다. 책이라는 인간의 창조물이 곧 생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순환 구조다.
필 하즈는 태양광 패널과 집수판, 저장탱크를 결합한 복합 구조물을 선보였다. 빗물을 저장하고, 중력을 이용해 내부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새의 배설물과 먹이활동까지 고려한 설계다.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생태계가 작동하는 실험적 구조로 주목받았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새집이 아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보금자리 안에서 인간과 생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의 지구는 점점 그 보금자리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줄지 않고, 생물다양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는 구조적 대응 없이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제사회는 목표만 반복할 뿐, 이행력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엔 더 악화일로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 환경의 날 가까이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환경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주권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이행과 구조적 전환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전시장에서 마주한 '녹슨 지구'는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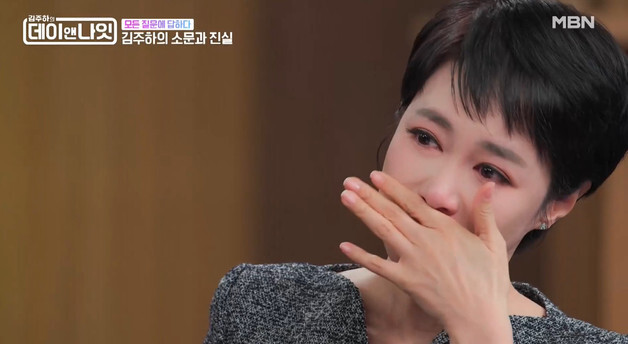








편집자주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기다. 이제 모두의 '조별 과제'가 된 이 문제는, 때로 막막하고 자주 어렵다. 우리는 각자 무얼 할 수 있을까. 문화 속 기후·환경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끌고,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