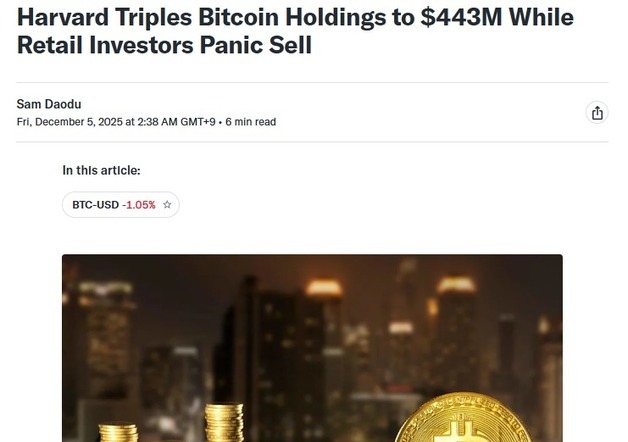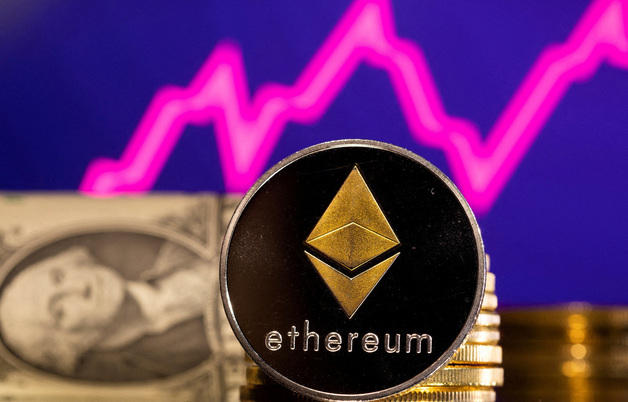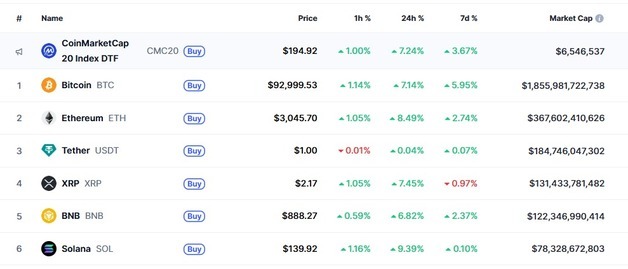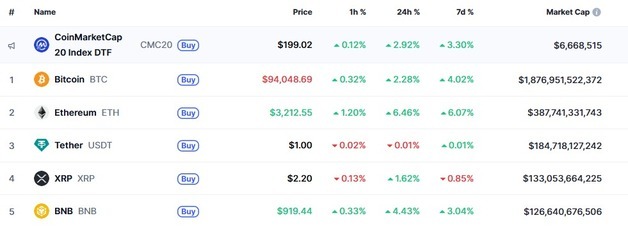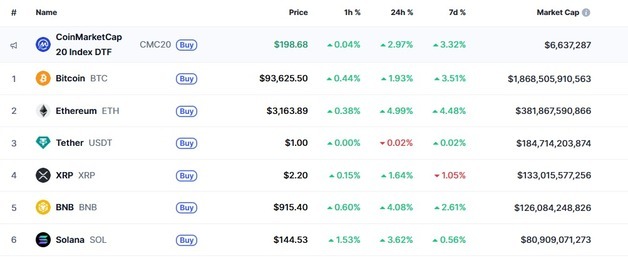[팀장칼럼]교육부 장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감을 하시겠습니까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만약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감을 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인터뷰를 마친 A교육감과 사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당시 새 정부가 막 출범해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고 지방선거는 1년도 채 안 남았을 때였다. 재선 교육감이었던 그는 3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었지만, 교육부 장관직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공식적 답변 자리도 아니었던 터라 A교육감은 편하게 답변했다. 그는 "장관직 제안이 오지도 않았지만 온다고 해도 교육감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곧바로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교육감이 장관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A교육감의 말대로 교육감 권한은 크다. 서울교육감을 예로 들면 학생 100만 명이 다니는 2000개 유·초·중·고교가 그의 관할이다. 5만 명 넘는 교육공무원들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한 해 1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 배정 권한도 서울교육감의 몫이다. 선출직인 만큼 공약한 정책도 별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 덕분인지 교육감은 '소통령'으로도 불린다.
반대로 장관급인 교육부 장관은 차관급인 교육감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유·초·중·고교교육 분야는 교육자치에 따라 대부분 교육청에 이양됐다. 장관의 부처 인사권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예산도 대통령실 등과 조율해야 한다.
그나마 장관이 쥐고 있던 고등교육 분야 감독·예산 집행 권한도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 내려놓으려는 분위기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까지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힘은 더 빠질 수 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 세종교육감 4선 도전도 가능했다면 대통령이 지명했더라도 교육감 선거를 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감은 3선까지만 가능하다.
권한 만큼 교육감의 위상은 부쩍 커진 상태다. 최근 교육감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이 이를 증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선 국회의원 등은 7개월이나 남은 교육감 선거 준비를 위해 벌써부터 몸풀기를 시작했다.
경쟁자들의 이름값에 현직 교육감들이 초조해할 정도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상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입성해 재임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1년 반짜리 교육감은 없지 않냐"며 에둘러 재선 도전을 예고했다.
정작 선거전은 커진 권한·위상에 비해 초라하다. 흔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칭한다.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도 않고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도 없는 데다, 후보 대상 여론조사나 TV 토론회 기회도 많지 않아서다. 지난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취임하고 나서야 유·초·중·고교교육을 공부하는 교육감이 적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더 교육감을 모른다.
교육계 최대 연례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한다. 교육감의 커진 권한·위상 만큼 우리의 관심도 더 커져야 한다. 사람을 알아야 교육의 미래가 보인다.
kjh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