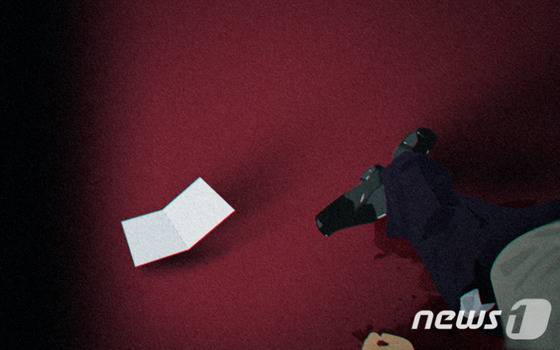[세월호 한달] 선원들, 그들이 한 것은 도망뿐
- 김호 기자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한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밝혀진 선장 이준석(69)씨와 선원들의 사고 당시 행적은 너무나 뻔뻔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게는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되풀이하고 자신들은 가장 먼저 구조정에 올랐다.
이씨 등 15명 가운데 기관부 선원 4명은 뻔뻔함을 넘어 위험의 순간에 비정하기까지 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당시 기관부 침실 앞 3층 통로에서 부상한 조리원 2명을 봤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친 조리원들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기관부원 4명은 처음으로 도착한 해경 구조정에 몸을 싣고도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리원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선장 이씨와 선원들은 서비스직 매니저들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탈출안내 등 추가지시를 요청하는 무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매니저 박지영(22·여)씨는 학생들을 구한 뒤 목숨을 잃었다.
선장 이씨 등이 사고 당시 있었던 조타실에는 배 전체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 방송장비를 작동(ON)으로 맞추고 4개 버튼(승조원 구역, 기사실 구역, 식당·매점 구역, 전 구역) 중 방송을 희망하는 구역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법이 간단하다.
그러나 이 방송설비를 활용한 선원은 없었다. 조타실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도, 기관실과 선원실에는 선내방송이 가능한 전화기도 있었지만 누구도 활용해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명의 탑승객이라도 더 구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선원들은 한가하게 자신들만 구조를 기다렸다. 옷까지 챙겨입거나 갈아입기도 했다.
이들이 합수부 조사 과정에 남긴 말은 기가 차게 한다. 이들은 "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수사팀의 물음에 "해경이 구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수백명의 목숨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 이씨와 선원들이 사고가 난 16일 오전 한 일은 오로지 '안전하게' 모여 첫 구조정에 몸을 실은 것 뿐이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