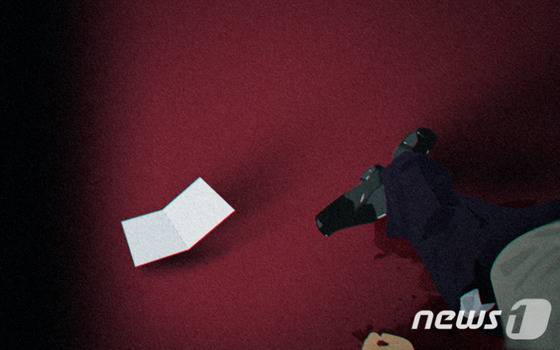강병철 작가 산문집 ‘어머니의 밥상’ 출간
상처마저도 아름답게 만드는 어머니 힘 그려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어머니의 밥상이 환자용 식기로 바뀌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밥상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금은 콧줄로 연명하시는 어머니를 처음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던 날, 앰뷸런스 안에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어머니의 굴곡진 삶이 그의 뇌리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지난한 세월에 녹아든 희로애락이 자신의 인생임을 새삼 깨달았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강병철 작가가 90대 중반의 노모를 테마로 한 산문집 ‘어머니의 밥상’(도서출판 작은숲)을 펴냈다.
초로의 작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밥상, 환자용 식기에 담긴 다소 초라한 밥상을 보며 어린 시절 어머니의 밥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추억의 힘은 어머니의 밥상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오랜 세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입맛마저 잃어버리고 사셨던 어머니의 밥상이 환자용 식기에서 비닐 호스로 바뀌면서 초로에 든 자식도 먹먹한 가슴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식구(食口)라는 말이 ‘먹는 입’에서 비롯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가족과 얽힌 추억은 대개 밥상에서 시작된다. 길가 푸성귀조차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맛있는 음식으로 거듭나고, 보리밥에 간장 하나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만 한 것 세상이 어디 또 있을까.
“어머니는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치유의 공간입니다. 따뜻함·포근함의 이면에는 눈물과 상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란 말에는 상처마저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이야기 외에도 식민지시대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아버지 이야기와 고향 바닷가 마을 이야기를 따뜻하고 눈물 나는 문체로 담아냈다. 몽글몽글 살포시 내려앉아 때로는 가슴 찡하게, 때로는 가슴 뭉클하게 하며 우리를 어린 시절 고향 어귀로 데려다 놓는다.
1957년 충남 서산 태생인 강병철 작가는 1983년 ‘삶의문학’으로 등단한 후 1985년 ‘민중교육’이란 잡지에 소설 ‘비늘눈’을 쓰고 해직을 당했던 고교 교사 출신으로 35년간 교편을 잡고 2019년 대산고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그간 소설집 ‘비늘눈’, ‘엄마의 장롱’, ‘초뻬이는 죽었다’, ‘나팔꽃’, 성장소설 ‘닭니’, ‘꽃 피는 부지깽이’, ‘토메이토와 포테이토’, 시집 ‘사랑해요 바보몽땅’, ‘호모중딩사피엔스’, 산문집 ‘쓰뭉선생의 좌충우돌기’, ‘작가의 객석’, ‘선생님이 먼저 때렸는데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적표’ 등을 발간했고, 한국작가회의 대전충남지회장, 청소년 잡지 ‘미루’ 발행인을 역임했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