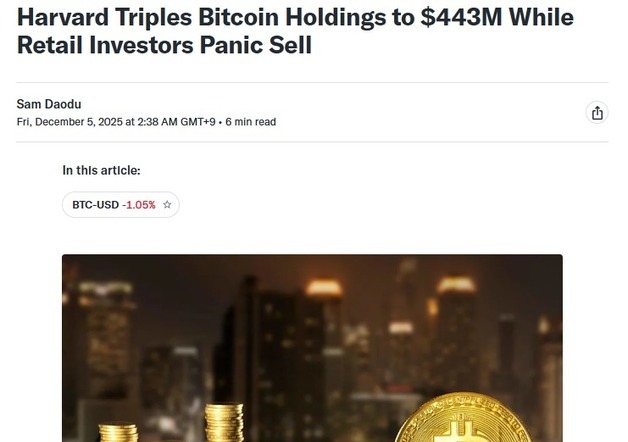[데스크칼럼]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 보호할 수 있나
(서울=뉴스1) 강은성 성장산업부장 = 2009년, 쌍용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은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했다. 경찰과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가 나왔고 회사도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사측과 국가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47억 원의 손실을 인정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일개 노동자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한 하청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의 '선의'(善意)를 따지자면 이토록 선하디선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행 노동법은 그 '선함'과 별개로 노동자에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빼앗고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휴수당 제도'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한 만큼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다.
현실은 달랐다.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대거 양산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근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몇 시간 단위의 초단기 알바를 전전하게 됐다.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역설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셈이다.
노동 정책은 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합리적 이기심'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늘 시험대에 오른다. 주휴수당의 사례에서 보듯,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기업의 회피 전략에 맞닥뜨리는 순간 그 부담은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법의 선의와 현실의 이기심이 충돌하면서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실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 분야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하청에 책임이 떠넘겨지거나 혹은 계약 파기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는 폐업을 하거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진정한 노동자 보호법으로 기능하려면, 원청과 하청의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불안정 노동 확산을 억제할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취지와 달리 주휴수당처럼 '악'(惡)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영훈 장관의 묘수를 기대해본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