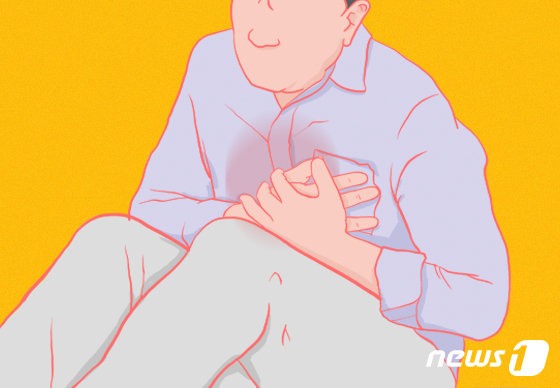'승자의 저주' 된 홈플러스 인수…'골든타임' 놓친 MBK 책임론
인수시 '5조 원' 무리한 대출…홈플러스 손실 키워
기습 회생 신청에 투자자 손실…인수자 아직 없어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홈플러스 모회사 MBK파트너스의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홈플러스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김병주 회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존대로 회생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회장의 무리한 인수 및 예상치 못한 선제적 기업회생 신청이 지금의 홈플러스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4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김 회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와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 김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형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를 이끌면서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로 불렸다. 지난해 4월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선 95억 달러(약 13조 원)의 재산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승승장구했지만 2015년 홈플러스 인수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7조 2000억 원이라는 과도한 입찰가를 써냈다. 이는 지금까지도 국내 사모펀드 거래 사상 최대 규모로 남아 있다. 이 중 자기 돈은 2조 2000억 원으로, 나머지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지적도 있었다.
무리한 인수 이후 MBK는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한 핵심 점포 등 부동산을 대거 처분하면서 4조 1100억 원을 확보했다. 매각한 점포는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했다. 차입금 상환 부담에 임차료까지 내게 된 홈플러스는 영업할수록 손실이 커지면서 기업회생 절차까지 밟게 됐다.
구속 위기까지 불러온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자, 나흘 만인 3월 4일 선제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판매하고,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사기 규모는 총 1164억 원이다.
업계에선 MBK 경영진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가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리한 자금 조달을 강행한 결과 손실을 투자자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불러오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졌고 현금만 말라갔다는 지적이다. 소득 없는 10개월 동안 인수 후보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국의 점포가 연이어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 2위였던 홈플러스 점포 수는 올해 롯데마트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 및 협력업체의 피해는 물론, 기존에 근무하던 수만 명의 홈플러스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향후 김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선 이 같은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실책이 검증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빠른 회생신청을 통해 회사를 최대한 살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임원들의 무리한 구속보다는 그동안 이어온 각종 협의를 마무리해 회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게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홈플러스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생 절차에 임할 것이며,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