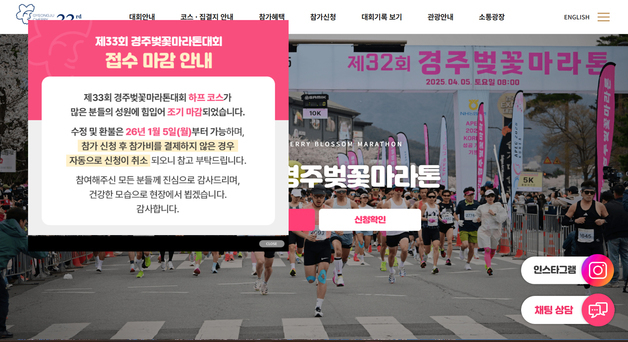우체국·농협만 즉시연금 쓰나미를 피해간 사연?
금융위·금감원 소관 밖 두 곳이 약관 더 정확히 작성
보험약관 베껴 쓰기·감독 당국의 부실관리 방증 씁쓸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권 안팎을 뜨겁게 달군 즉시연금 사태. 사실상 금융당국과 소송전에 들어간 이 즉시연금의 약관 한 줄 덕에 피해간 단 두 곳. 바로 우체국과 NH농협생명이다.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고 승인받은 일반 보험사들은 그 약관에 발목이 잡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통부 소속 우체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었던 농협생명은 정통 금융회사들보다 탄탄한 약관을 둔 덕에 혼란을 피해 눈길을 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즉시연금 논란이 일자 과거 자신이 가입했던 즉시연금 약관을 확인한 뒤 안도했다고 한다. 김 회장이 가입한 상품은 우체국 즉시연금이다.
현재 생명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 간 갈등을 부른 문제의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넣어두면 보험사가 그 돈을 재원으로 굴려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은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우체국 즉시연금은 만기환급형은 아니지만, 목돈을 넣어놓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는 같다. 우체국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 지급에 대해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이라고 명시했다. '연금계약 적립금액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석까지 달았다.
우체국은 2011년 9월부터 즉시연금을 팔았다. 넣어두는 목돈(납부 보험료)은 최저 500만원, 최고 2억50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출시 당시 공시이율은 4.8%이었고 최저보증이율은 2%를 적용했다. 당시 즉시연금 상품은 비과세 혜택 덕에 인기가 많아 일반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우체국과 상호금융권도 일제히 이 상품을 내놨다.
특히, 다른 보험사들은 가입 문턱이 1000만원이었으나 우체국은 문턱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전국 창구와 설계사를 통해 영업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우체국 즉시연금은 출시 1년간 판매 실적 1조3000억원을 올릴 정도로 선전했다. 그러다 정부가 2013년 2월부터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추고 시중 금리가 하락하며 즉시연금 인기가 식자 여러 회사가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우체국도 2012년 말에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생명은 농협중앙회 소속이었던 2007년에 즉시연금 상품을 내놨다. 농협생명은 약관에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서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농협생명은 2012년에 농협중앙회에서 분리 출범한 뒤 즉시연금 신상품을 내놓으면서도 같은 내용을 집어넣었다. 농협생명 약관에서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서'라는 부분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우체국은 금융상품을 팔지만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 금융권에서 '통제 밖'의 영역이라고 불린다. 농협생명 역시 금융당국 소관으로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깐깐한 지휘를 받는 일반 금융사들보다 느슨하다는 말이 나오곤 했던 이유다. 그런데 즉시연금 사태에서는 정반대 처지가 됐다.
금융감독원과 거세게 충돌한 국내 1·2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을 보면, 우체국이나 농협처럼 공제에 대한 명시가 없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삼성·한화생명 약관과 같거나 비슷했다. 문제가 되고 나서야 개정을 통해 공제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생명보험사들은 공제는 보험의 원리고, 약관 외에 기초서류에 공제에 대해 쓰여 있다고 항변한다. 문제의 약관을 심사·승인한 주체는 금융감독당국이었다.
우체국과 농협생명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각각 과기정통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체국과 농협생명이 약관 덕에 즉시연금 사태를 비껴갔다는 점은 그만큼 일반 보험업계에 만연했던 '약관 베껴 쓰기' 관행에서 보험사들과 감독 당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eriwha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