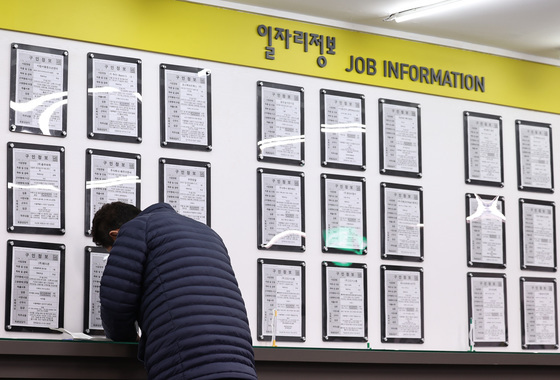러시아 만나고 미사일 쏜 北…이번엔 시진핑 '승리' 연출에 집중?
[경주 APEC] 김정은, 트럼프 '러브콜'에 대화 아닌 북·중·러 연대 선택
김정은-트럼프 만나면 미중 정상회담 주목도 낮아져 의도적으로 회피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에 이어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적 행동으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인 28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이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한 다음 날 단행된 것이다.
대미 외교의 책임자인 최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러시아를 간 것만으로도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도발까지 이어지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감하에 미국과 아직은 거리를 두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김 총비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북중러 3각 결속'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러시아, 관세와 안보 문제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중국과 북한이 '반미 연대' 기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전략적 연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APEC에 앞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러시아는 북한을 모스크바로 불러 "미국이 전 세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북한 역시 지난 22일 평양에서 경주까지의 거리(약 450㎞)와 비슷한 사거리(약 43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에도 기습 타격용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과 지난 27일, 그리고 이날 한국에 도착하면서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부르고,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보인 미국에 대한 태도는 곧 미국과 담판에 나서야 할 중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3각 연대의 파트너로서 미국과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의 태도를 보면, APEC 계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도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데다가, 북한이 시 주석의 외교 무대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외교적으로 승리하는 그림을 가져가도록 조용히 움직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미사일 발사는 '권위주의 연대' 속에서 중·러와 보조를 맞춘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응답은 시 주석을 배려했다기보다 자체적인 전략적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김정은 총비서가 9월 시정연설에서 이미 미국에게 '비핵화 집념을 버려야 만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북미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깜짝 회동에 응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엔 처음부터 응답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