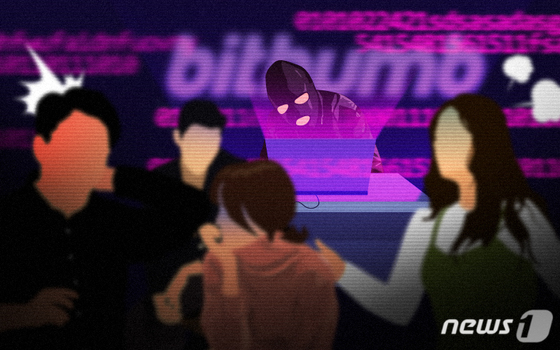[기자의눈] 활개치는 짝퉁 K-뷰티, 침묵하는 공범 '유통'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요즘 K-뷰티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다. 잘 팔리는 만큼 더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 "정품이죠?"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성분표도, 제조 공정도 아니다. 바로 판매처다. 어디에 올라왔는지, 후기는 얼마나 쌓였는지. 이제는 그런 유통 환경이 정품을 증명해 주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그 신뢰는 생각보다 쉽게 자주 깨진다. 정품처럼 보이는 가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 들기 때문이다. 포장과 라벨은 정교해졌고, 사진은 번지르르하다. '정품 100%'라는 문구와 후기 몇 줄이면 의심은 사라진다. 결국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이 유통되는 환경이다.
이 지점에서 책임을 단순히 가짜를 만든 쪽에만 물을 수는 없다. 유통의 문을 쥐고 있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판매자를 모으고, 거래를 성사하며, 물량을 흘린다. 정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결국 유통의 힘이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린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며 발을 빼려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슈가 커져 발을 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회수 공지, 거래 중단,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온다. 하지만 그 사이 가품은 이미 배송됐고, 누군가는 얼굴에 바른 상태다. 피부 위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통 단계에서의 사후 조치는 늘 늦다. 시장은 이미 돌아갔고,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다.
온라인에서의 삭제가 해결이 아니라 사후 정리에 불과한 것처럼 유통에서의 '거래 중단'도 근본 처방은 아니다. 가품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유통이 가장 소극적이라면 가품 근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통업자들 입장에서는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 "효과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은 그 '선'이 명확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트러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고, 유통은 "몰랐다",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구조가 과연 맞나.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이 문제는 화장품에만 머물지 않는다.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 K-톡신도 마찬가지다. K-톡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 품목이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가짜 톡신이 정품과 섞여 유통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톡신은 화장품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짜 제품이 유통망에서 계속 걸러지지 않는다면, K-톡신은 외부 경쟁자가 아닌 가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신뢰로 성장한 시장은 신뢰가 한 번 꺾이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회복은 훨씬 더디고 어렵다.
가짜를 막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유통 단계에서 판매자와 공급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품 인증을 의무화하며, 의심 물량을 상시 모니터링하면 된다. 반복 위반한 유통사나 거래처는 영구 퇴출하고, 위조 적발 시 단순 거래 중단을 넘어 정산 중단 같은 실질적 페널티를 걸 수 있다. 수사 협조 역시 '요청 시'가 아니라 '즉시'로 바꿔야 한다.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막으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누가 가짜를 만들었는지보다, 왜 이렇게까지 쉽게 팔리게 뒀는지를 물어야 한다. 짝퉁이 넘쳐나는데도 유통이 방기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방조에 가깝다. 정부도 유통도 "대응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결과를 내놔야 한다. 더 미루면 그 피해는 또 소비자가 떠안는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