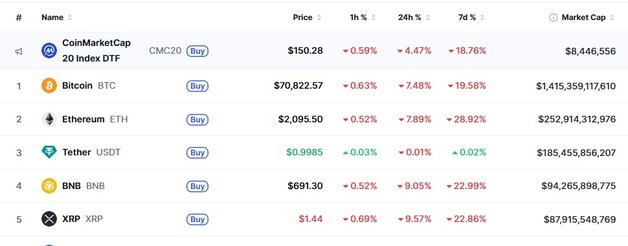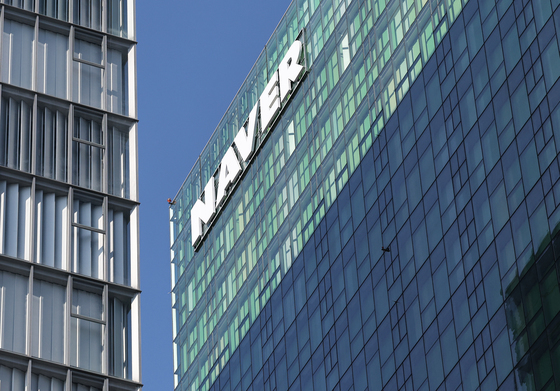소비자 기만 '아웃'…가격만 보던 '치킨', 양·열량까지 살핀다
오는 6월 '중량표시제' 계도 기간 종료…어길 시 행정처분 조치
열량·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도 단계 추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한 마리 치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치킨 정보를 보다 자세히 공개한다. 오는 7월부터 중량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열량·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비용과 건강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치킨 중량표시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됐다. 해당 업체들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오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치킨은 가격이 같아도 양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 기만 논란을 빚어 왔다.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판매해 사실상 가격은 더 올라간 셈인데, 정부는 이러한 용량 꼼수 대응 방안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직접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중량을 표시할 때는 그램(g)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한 마리로 조리 시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특히 다리나 날개 등 조각 단위로 판매되는 부분육의 경우 중량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도 표시를 가능하게 한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개수로 판매해 온 곳은 중량으로 표시할 경우 개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해 업체가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량 표시제를 조리 전 기준으로 정한 것은 "튀길 때 수분이 빠져나가고, 튀김 옷이나 양념 등 재료에 따라 중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치킨은 햄버거·피자 등에 이어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어린이·청소년의 배달 음식 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열량과 나트륨, 당류, 단백질 등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안심하고 외식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자율 참여를 거쳐 내년부터 가맹업소 300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본격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가맹업소 100개 이상, 2029년에는 5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참여율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영양성분 분석 비용과 메뉴판·포장재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소·중견 프랜차이즈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용기 식생활영양과장은 "현재 (업체 규모) 상위 15개 정도는 이미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다"며 "제도 의무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를 고려해 영양성분 분석 비용을 지원하고, 표시 참여 업체에 대한 홍보를 돕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 과장은 "한꺼번에 의무화를 적용하기보다는 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업체당 약 250만 원가량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