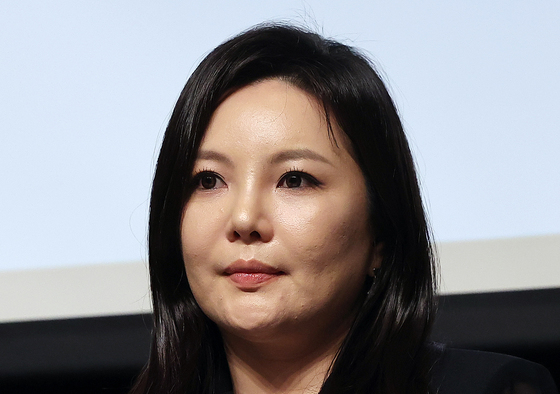"마지막은 집에서"…재택·완화의료 연계, 제도화 논의 본격화
서울대병원, '돌봄-재택의료 완화의료' 심포지엄 개최
의료진 “의료진과 함께 결정해야” "지역사회에서 연속성 유지"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와 완화의료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돌봄 사례와 정책 과제를 짚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오후 1시 서울대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는 돌봄–재택의료와 완화의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와 공공진료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현실에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처치나 가족과 떨어진 채 마지막을 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생애 말기에도 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속하는 것이 최선의 의료이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택의료는 병원이 아닌 환자의 거주지에서 이뤄지는 의료 서비스로, 만성질환자와 말기 환자가 자신의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완화의료는 통증과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애 말기 돌봄으로, 재택의료와 함께 환자의 마지막 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병원 중심의 치료만으로는 임종을 원하는 환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이 중증 환자 재택의료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이 제도 개선 논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의료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서울대병원 재택의료센터 부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재택의료팀이 돌본 환자 가운데 약 60명이 사망했고, 이 중 40%는 자택에서 임종했다"며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과 함께 생애 말기의 결정을 내리고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의료는 단순한 외래 진료의 연장이 아니라, 병원과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애 말기 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개된 임상사례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던 70대 폐암 말기 환자의 10개월간 재택의료 기록이었다. 이 환자는 2018년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6월 말기 판정을 받고 완화의료팀을 거쳐 재택의료팀으로 연계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딸과 함께 집에서 지내다 임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의료진은 산소 처방, 약물 조절, 가족 면담을 포함해 총 13차례 외래 진료, 8차례 가정 방문을 진행했다.
응급실 방문 이후에도 환자는 입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임종까지 재택 돌봄을 이어갔다. 임종 전날 간호사가 방문해 증상을 설명하고 임종 간호를 진행했으며, 환자는 20년을 살아온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가족은 "환자가 마지막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범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루게릭병처럼 질환 경과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환자의 경우, 사전돌봄계획을 통해 의사를 조기에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화의료와 재택의료가 협력해 생애 말기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