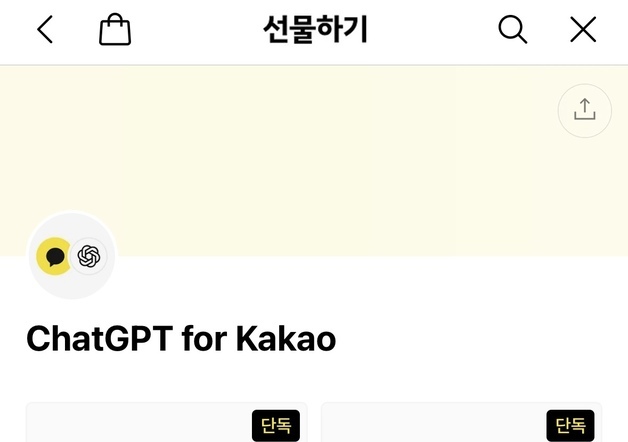미국을 '트럼프'로 도배하다…미국은 지금 '개명 전쟁' 중
미국 주요시설·정책 명명…'트럼프 브랜드' 홍보 효과
이례적 現 대통령 기념 행보…'개인 우상화' 비판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지난 2018년 4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저택 마운트 버넌을 견학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견학 중 워싱턴이 왜 자신의 저택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그가 똑똑했다면 자기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며 "물건에 이름을 붙여야지, 안 그러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억되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 트럼프는 재선 후 지난 1년간 수도 워싱턴DC의 주요 시설, 정책 프로그램, 신무기 등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데 열중해 왔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 연방정부의 주요시설에 이름을 추가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워싱턴DC의 연구기관 미국 평화연구소를 '트럼프평화연구소'로 개칭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안정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달에는 트럼프의 측근 인사가 장악한 워싱턴 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개명한 뒤 트럼프의 이름을 건물 외벽에 붙이며 논란을 초래했다. 명칭 변경 뒤 재즈그룹 더 쿠커스, 뉴욕의 무용단인 더그 바론 댄서스 등이 줄줄이 공연을 취소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뉴욕-뉴저지 터널 건설에 연방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과 뉴욕 펜 스테이션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로 시행하는 정책, 심지어 신무기 개발 계획에도 트럼프의 이름이 붙는다. 지난달에는 미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트럼프Rx' 웹사이트를 열었고, 같은 달 공개한 신생아 연방저축 계좌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직접 차세대 미 해군 전함 25척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트럼프급'이라고 명명했고,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뿐 아니라 트럼프의 모습을 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에도 국립공원재단의 사진공모전 우승작 대신 트럼프의 얼굴 이미지가 담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의 초상이 그려진 1달러 동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재임 중 그의 이름을 딴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1975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은 미시간주 연방정부와 법원 청사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임 중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연방 정부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대비되는 트럼프의 '광폭 개명' 행보에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처럼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시도를 두고 도시 차리친을 스탈린그라드로 개명한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루브르박물관을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개명한 나폴레옹 1세와 비교하며, "대통령 역사상 유례없는 자기 과시가 그를 정복자나 독재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벤 로즈 레드우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USA투데이에 "저속한 상업주의와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의 결합이다. 이는 정부와 국가 자산을 대통령 본인의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는 행태"라며 이를 '지명 나르시시즘'(toponymic narcissism)이라고 명명했다.
트럼프가 온갖 정책에 이름을 붙이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브랜드'를 각인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사업가 시절 자신의 이름을 딴 리조트, 식당, 골프장으로 소비자들에게 개인 브랜드를 홍보하던 방식을 유권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린스턴대의 대통령 역사학자 줄리언 젤라이저는 "지속가능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건물이나 배에 이름을 새기기가 훨씬 쉽다"면서도 이러한 행보가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기에는 "매우 빈약하다"고 로이터통신에 지적했다.
jw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