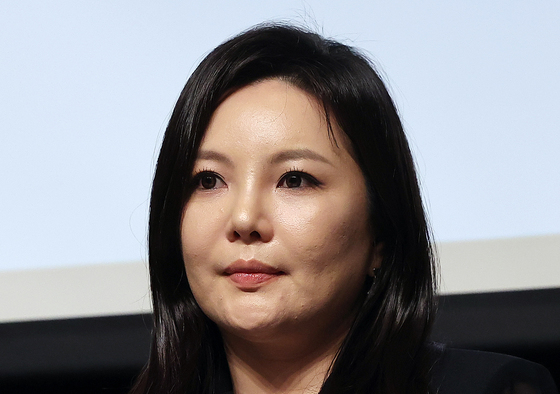외신에 수시로 등장하는 '글로벌 사우스'…정확한 의미는?[줌워드]
소련 붕괴 후 '제3세계' 대체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단순히 '개발도상국' 의미로 볼 수 없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편에 서기를 꺼리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는 왜 러시아를 지지하는가'라거나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통상적으로 북미나 유럽 등과 같은 '글로벌 노스'에 반해 글로벌 사우스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으로 지칭되는 국가가 포함된다고 알려졌지만, 단순화하긴 어렵다.
글로벌 사우스는 결코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는 인도나 중국과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하지 않는다.
뉴델리에 본부를 둔 전략 및 국방 연구 위원회의 창립자인 해피몬 제이콥은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적, 지정학적, 역사적, 발전적 개념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소련 붕괴 이후 '제3세계' 대체할 용어로 부각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는 1969년 정치 운동가 칼 오글스비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당시 진보 성향의 가톨릭 잡지인 커먼웰에 기고한 글에서 베트남 전쟁이 북부의 '글로벌 사우스 지배' 역사의 정점이었다고 서술했다.
글로벌 사우스가 점차 부각된 것은 소위 '제2세계'로 불렸던 소련이 1991년 붕괴되고 난 이후였다. 그때까지 아직 완전히 산업화를 이룩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는 용어는 '제3세계'였다.
제3세계라는 용어는 1952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소비자 주장한 용어다. 그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제1세계'로 분류했으며, 소련을 '제2세계'로,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로 분류했다.
사회학자 피터 워슬리 1964년 자신의 저서 '제3세계:국제 문제의 중요한 새로운 세력'을 통해 '제3세계'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다. 그는 주요 강대국 블록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로 이룬 국제 조직 '비동맹 운동'의 중추를 형성하는 '제3세계'를 언급했다.
다만 제3세계라는 용어 결국 빈곤이나 비참함, 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인해 제2세계가 종말되면서 자연스레 제3세계라는 용어도 사라지게 됐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이 용어는 점차 쓰이지 않게 됐다.
한편 선진국-개발도상국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요컨대 '서구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내세우고, 이 범주에 들지 못한다면 낙후된 국가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 누가 쓰느냐에 따라 기준도 달라
결국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글로벌사우스에는 어느 나라가 포함되는가. 이는 누가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엔의 경우 77그룹(G-77)을 유엔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로 지칭한다. 그러나 2016년 12월 기준으로는 134개국이 분류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과 몇몇 부유한 걸프 국가도 포함된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롤프 트래거는 유엔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손쉽게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125개국이 참여했으며, 이때는 중국과 파키스탄은 불참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는지 여부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5000달러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한다.
결국 기준이 모호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사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지난 5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서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펀드 이안 레서(Ian Lesser)는 다만 이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글로벌 노스' 국가들임을 지적한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국가가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로 지칭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는 비록 '글로벌 사우스'가 일정한 기준이나 관점으로 묶인 집단은 아니지만 "모든 전략이 서구에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짚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