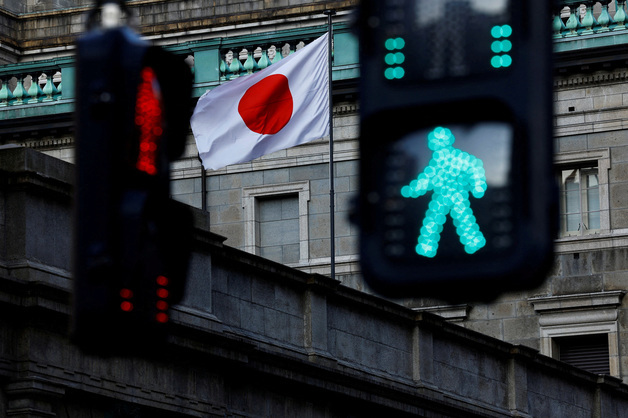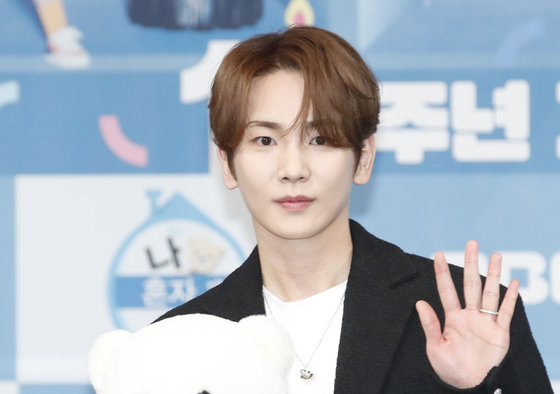푸틴 돈바스 요구에 우크라인 분노…전쟁 피로 속 진퇴양난
우크라 사수한 도네츠크 30%까지 양보하라는 푸틴
우크라인 75%, 영토 양보 반대…"美안보보장시 허용" 목소리도 늘어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완전히 받는 대신 재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땅을 빼앗길 수도,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75%가 러시아에 영토를 공식 양보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지쳐서 확실한 안전보장만 된다면 영토를 넘길 수 있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남은 미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것,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는 전선 동결 등이었다. 루한스크는 거의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도네츠크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수만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영토의 약 30%를 통제 중이다.
돈바스는 광물과 산업이 풍부한 요지다.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야로슬라프 흐리차크는 이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것은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흐리차크는 "이곳은 우크라이나 영토"라면서 "이 지역 주민들, 특히 광부들은 우크라이나 정체성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곳에선 유명 정치인, 시인, 반체제 인사도 나왔다"고 말했다.
돈바스 전체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 고향을 떠나는 난민들이 더 증가하게 된다. 2014년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이후 최소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돈바스 지역을 떠났고 300만 명 이상이 러시아 점령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는 30만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푸틴 평화안대로 되면 이들 중 일부는 원하지 않음에도 러시아 치하에서 살거나 고향을 떠나야 할 수 있다.
키이우 국제 사회학 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75%가 공식적인 영토 양도에 반대한다. 러시아가 땅을 차지한다고 평화를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더 많은 지역 침략의 교두보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후 수십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특히 돈바스 지역의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도네츠크 크라마토르스크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한 56세 남성은 "도네츠크 지역의 항복에 관해 묻는다면, 나는 이 전쟁을 킬로미터가 아닌 인명 피해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천 제곱킬로미터를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생명이 영토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땅을 더 잃느냐 생명을 더 잃느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러시아에 영토를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초유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도 불투명해 우크라이나인들은 더욱 혼란에 차 있다.
영토를 공식적으로 이양하려면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결국 러시아 영토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사실상의 통치권을 이양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절차가 되어야 할지 제대로 아는 이가 없다.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 볼로드미르 아리예프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그냥 협정에 서명하면 되는 건가? 정부나 의회가 서명해야 하는 건가?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정자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회담에서 시사한 것이다.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영토 교환은 "단순한 서면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보장"이 있어야만 고려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영국 해군이 오데사 항에 주둔한다면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