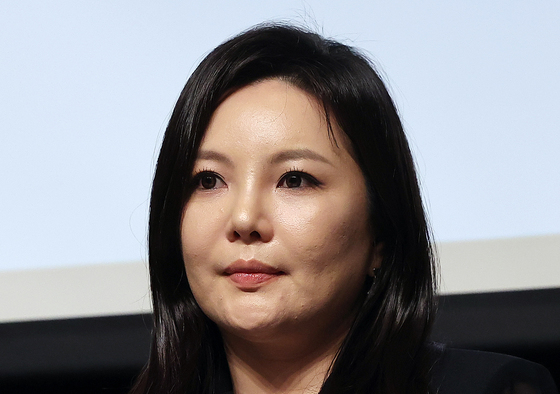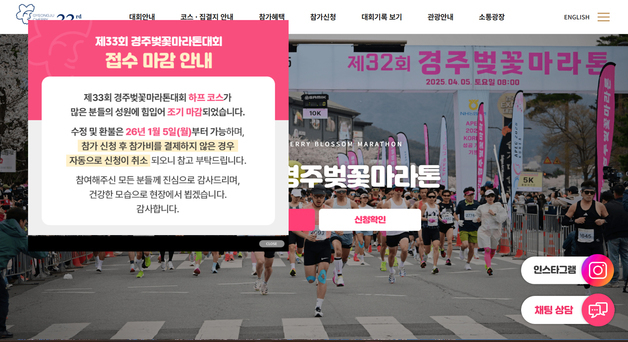[AG] ‘테콩’을 아시나요, 괴팍하게 재밌는 세팍타크로
- 임성일 기자
(부천=뉴스1스포츠) 임성일 기자 = 세팍타크로는 아주 흥미로운 스포츠다. 명칭부터 경기 규칙과 진행 방식까지 이름처럼 아주 괴팍하다. 우리에게는 생소하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인기 스포츠였다. 궁중 경기로 출발해 1945년 코트와 네트를 갖춘 형태로 발전했다.
낯선 명칭은 사실 간단한 조어다. ‘발로 차다’라는 말레이시아어 ‘세팍’과 공을 뜻하는 태국어 ‘타크로’의 합성어다. 1965년 명칭을 ‘세팍타크로’라고 통일했는데, 그만큼 두 나라의 입지가 대단하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종주국임을 자처, 현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원조 국가의 권리(?)를 주고 있다. 역사도 괴팍하다.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는 종목이다. 우슈, 카바디, 공수도, 크리켓과 함께 아시안게임에서만 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야구나 볼링, 스쿼시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지만 ‘아시아적 배경’을 가진 세팍타크로나 우슈, 카바디와는 다른 이유다.
인천 아시안게임 덕분에 현장에서 지켜본 세팍타크로는 이름이나 역사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요소들로 채워진 스포츠였다. 배구와 족구를 합쳐 놓은 듯한 형태라는 것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태국형 족구’나 ‘말레이시아식 배구’라는 설명만으로 담기는 어렵다.
24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여자대표팀과 미얀마의 세팍타크로 여자 단체전 B조 예선은 세팍타크로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세팍타크로 단체전은 세 팀이 하나의 팀이 된다. 세 명이 한 팀(레구)이 된 3대3 경기가 세 번 치러진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따라서 예비선수를 포함해 최소 9명 이상이 필요하다. 레구 1, 2, 3에서 2경기를 따낸 팀이 전체 경기를 가져오게 된다. 배구나 배드민턴의 세트 개념인 ‘게임’도 3판 2승제로 진행된다. 하나의 게임은 21점을 선취하는 방식이다.
레구를 구성하는 3인이 각자 역할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는 것도 이색적이다. 공격을 담당하는 ‘킬러’, 서브와 리시브가 주 역할인 ‘피더’ 그리고 서브를 넣는 ‘테콩’으로 구성됐다. 몇 사람을 거치든 3회 이내에 상대 진영으로 공을 보내야 한다. 킬러라고 수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킬러 혼자서 공을 받고 띄운 뒤 공격을 해도 무방하다.
남자 대표팀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더블’이 피더와 킬러로만 구성된 것과 달리 레구는 테콩이라는 ‘스페셜리스트’가 추가된다. 레구에서 테콩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서브가 곧 첫 번째 공격이 되는 까닭이다.
네트 좌우 모서리에서 공을 알맞게 던져주면 진영 중앙 원 안에 있는 테콩이 강한 서브를 넣는다. 상대가 강한 서브를 대비하고 있을 때는 네트를 살짝 넘기는 속임수도 쓴다. 머리 싸움도 중요하고 발끝의 정교함도 필요하다.
배구나 탁구, 배드민턴 등 네트를 사이에 두고 펼치는 종목들 모두 서브가 중요하지만 세팍타크로에서는 그 비중이 더 크다. 남자 더블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김영만은 “세팍타크로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서브를 전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준비해서 훈련해야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테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테콩’과 ‘킬러’ 그리고 ‘피더’ 등 생소한 이름들이 어우러진 세팍타크로 코트는 묘기들이 난무한다. 작고 탄력이 좋은 공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 공중해서 더 강하고 빠르게 때리고 막기 위해 선수들은 공중제비를 수시로 펼친다. 여자 선수들도 무협영화 주인공처럼 날아다닌다. 공격을 성공한 뒤 도발적 세리머니로 네트 너머 상대를 자극하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보면 볼수록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종목이 세팍타크로다. 족구라는 한국적 스포츠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소에는 자주 접할 수 없기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세팍타크로의 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lastunc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