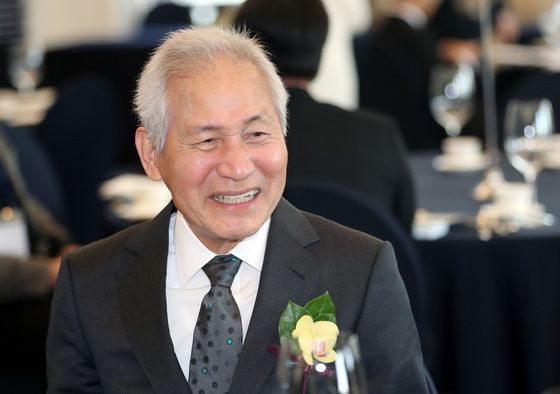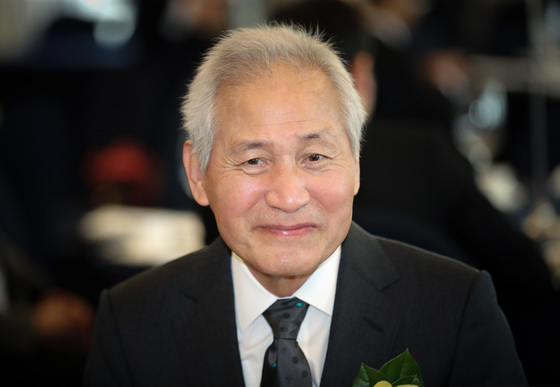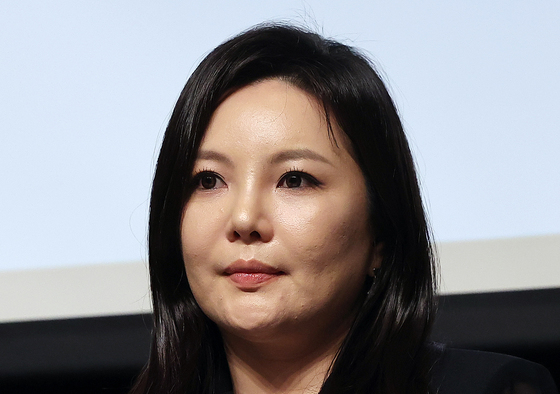교제폭력 신고하고도 숨진 여성들…미국은 '피해자 공포심'부터 따져
잇단 사건에 검경 관련 조치…전담검사·재범가능성 엄격히 평가
영국, 판결 전에도 최대 10년 접근금지…한국은 1~3개월 수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최근 전국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들이 숨지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을 도입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추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 5층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력 용의자는 같은 노인보호센터에서 1년가량 함께 근무한 60대 남성 A 씨다. 그는 올해 3월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총 3회 경찰에 신고당해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B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이 신고까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 씨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엿새 만에 전화 168회, 문자 400통가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통신 접근 금지)·4호(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일주일 뒤 재차 경찰은 1~3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가장 강한 조치인 구금은 빠졌다.
관계성 범죄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반복되자 검경도 발 빠르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잠정조치 여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틀 뒤인 31일 경찰은 8월 한 달간 스토킹으로 접근 조치를 받은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추가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엄격히 평가해 구속영장 신청 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성 범죄 예방과 엄벌을 위해 해외 제도를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23년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학술지에 실린 '해외 스토킹 처벌법 입법례 관련 시행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스토킹 상황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추세다.
주마다 다르지만 53% 주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지, 20% 주에서는 당사자인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간주하지만 대부분 한 번의 범죄로는 강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영국은 지난 2019년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해 형사판결 받기 전이라도 위험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행위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식 보호명령으로 적게는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100m 이내 접근 금지·피해자 전기통신 접근 금지는 3개월, 구금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