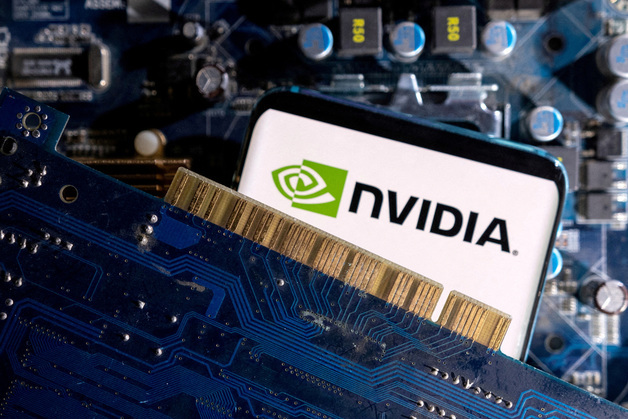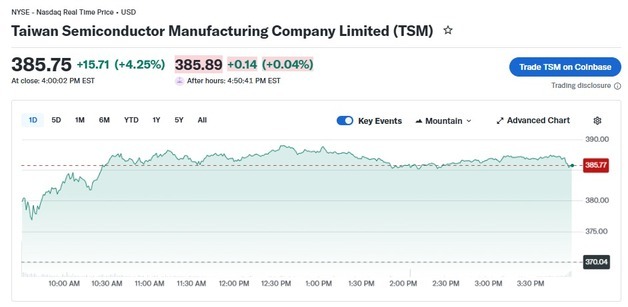위헌정당·특검 압박 국힘 '속수무책'…빠른 '尹 손절' 더딘 '쇄신'
위헌정당 공세 속 압색까지…여론전 외에 대응 수단 없어
尹 재구속에 구주류 일제히 침묵…혁신안 '당원' 결정에 맡겨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수사가 야권 인사 전반으로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실천적 조치가 없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 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고, 친윤계 등 구주류 의원들도 입을 닫았다.
11일에는 해병대원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임 의원 사무실 앞으로 모이라고 공지했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0여 명이 현장에 모였다.
앞서 윤상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특검 수사가 야권 핵심 인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강제 구인과 출장 조사 등 고강도 수사도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사정당국과 보조를 맞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한다"며 특검 대응 전담기구 설치를 예고했지만, 여론전 외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구 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중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며 구성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후문이다.
특검 1순위로 지목된 의원들은 함구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피의자로 지목된 한 야권 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건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론전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일부 의원은 혐의가 거의 확실한 수준이고, 나머지는 불똥이 튈까 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야당 탄압'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계엄까지 추진한 전직 대통령인데 특검 명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더욱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상태여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도 반박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여론에 기대야 하지만, 민심도 싸늘하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이어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추락했다. 2020년 1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선을 밑돈 수치로, 민주당(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당 혁신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당일(10일), 1호 혁신안으로 대통령 부부의 전횡·계엄령·탄핵 대응에 대해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전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공식 절연’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상태이며 탈당까지 한 마당에, 그를 계속 감쌀 정치적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혁신안 실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과하다', '사과 전문 위원장다운 안건'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사과하고 절연하고 이미 할 거 다 했는데 뭘 또 사죄문이냐"며 "과거로 가는 게 무슨 혁신이냐"고 날을 세웠다.
영남권 당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들이 주류인 상황에서, 혁신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쳐도 당원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