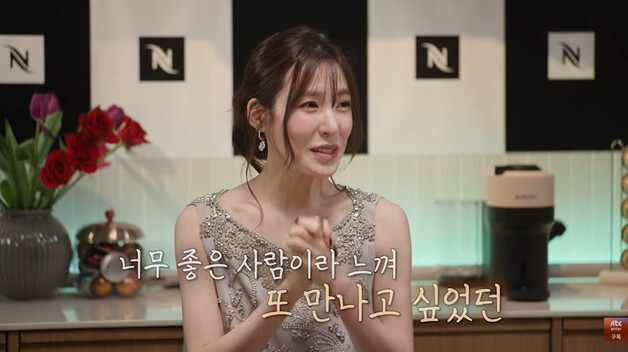"마라톤 끝내고 맛집 갈까"…마라톤 해외여행 할 만한데 [홍콩마라톤 완주기]
대회 전날 대규모 엑스포로 도시 축제 분위기
세심한 통제와 운영…주로 급수시설도 다양해
- 이상휼 기자
(홍콩=뉴스1) 이상휼 기자 = 홍콩의 굴곡진 도로를 42㎞나 뛰게 될 줄이야. 어쩌다 해외 마라톤에 참가했다. 주로 가끔 혼자 동네에서나 타지 여행 갔을 때 5㎞씩 뛰는 게 전부이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풀코스 마라톤은 작년 안동마라톤 완주가 처음이었고, 홍콩마라톤이 두 번째 도전이다.
시작은 이랬다. "형, 홍콩 마라톤 어때요? 마라톤 해외여행. 뛰고 나서 홍콩 맛집 탐방 가시죠." 가끔 내게 러닝을 가르쳐 주던 동생의 이러한 권유를 받고,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영웅본색 브로맨스의 도시 홍콩 가도를 달리기로 결심했다. 해외 주요 도시를 두 발로 장시간 달리면서 여행하고 싶었다.
스탠다드차타드 홍콩 마라톤(Standard Chartered Hong Kong Marathon)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찌저찌 신청했고, 얼마 후 선정됐다는 통보 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나를 꼬드겼던 동생은 추첨에서 탈락했다. 동생은 "형, 2차 추가 모집이 있으니까 형 먼저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하시죠"라고 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항공권과 숙소를 검색했고 마침 참기 어려운 가성비를 발견해 예약했다. 그 동생은 2차 추가 모집도 탈락했다.
얼마나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길래 접수령을 넘기가 그리 힘든지. 달리 생각하면 덜컥 당첨된 만년 달리기 초보자 수준인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싶어 포기하기도 아쉬웠다. 혼자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등산이나 달리기도 주로 혼자 하는 편이라, 해외 마라톤도 혼자 하기로 결정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어 겨울. 실내 트레드밀 달리기를 전혀 하지 않는 나로서는 야외 러닝마저도 추워서 거의 못 하고 살만 찌웠다. 비육지탄의 계절이었다. 그럼에도 의욕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전 예약한 항공권과 숙소는 취소하기 아까워 '뛰다가 걷다가 어떻게든 완주하겠지' 정신승리하면서 홍콩에 갔다.
수년 만에 간 홍콩은 종이 입국신고서가 폐지돼 한마디 말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여권과 안면만 보여주면 간단히 입국허가됐다. 한국의 충전식 체크카드(트래블월렛)로 공항버스에 태깅하니 홍콩마라톤 엑스포가 열리는 카이탁아레나 인근으로 직행했다. 택배로 사전에 대회 용품을 발송해 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홍콩도 마찬가지) 각국은 대회 며칠 전부터 전날까지 마라톤 엑스포를 연다.
고양 킨텍스를 닮은 형태의 카이탁아레나 곳곳에는 전시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마라톤 엑스포장으로 가는 길에 헐거운 티셔츠를 걸친 로봇이 내게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행인 중에 나만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런 나를 보고 홍콩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를 동양인들이 웃었다.
엑스포 행사장에서는 메일과 앱을 통해 받은 참가자 QR코드를 통해 엄격히 동선을 통제했고, 많은 인파가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 레이스팩은 내가 받아본 대회 중 역대급으로 두둑했다. 티셔츠, 러닝벨트, 보디로션을 비롯해 협찬 물품이 가득했다. 우리나라 대회의 기념품들과 비교되는 묵직함이었다. 러닝 관련 브랜드뿐만 아니라 토요타 자동차도 전시돼 있었다. 볼거리가 많은 만큼 인파도 많았다. 주말인 그날 저녁 홍콩서 유명하다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 행사가 열리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대회 당일, 참가자들의 짐 보관소는 침사추이 스타페리 선착장에 마련됐다. 스텝들은 정체 없이 짐을 받아 체크해줬다. 내 짐보따리가 꽤 큰 편이었는데 스텝들이 몇몇 달라붙어 꾹꾹 눌러 케이블타이로 결박해 줬다. 스타트지점까지 코스별 라인이 설치됐고 곳곳에 서 있는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막힘없이 시작 지점으로 갈 수 있었다. 국내 여러 러닝대회에 나가봤지만 홍콩마라톤처럼 깔끔한 운영을 본 적이 별로 없다.
새벽부터 2만여 명의 풀코스 참가자들이 주룽반도의 척추로 불리는 네이선 로드에 서서 출발을 기다렸다. 한국인 참가자들도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
오전 6시 50분께 공식 출발했다. 달리는 동안에도 운영의 세심함이 돋보였다. 전문 사진작가들이 주로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보급소도 체감상 2.5㎞마다 만날 수 있었다. 우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테이블 몇 개가 나왔고, 다음 물에 젖은 스펀지들이 올려진 테이블, 그다음 물, 그다음 이온음료 순으로 등장했다. 30㎞ 이후에는 바나나와 사탕을 비롯한 당류 에너지도 보급됐다. 물과 이온음료 테이블 옆에는 종이컵을 버릴 수 있는 서너평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그 공간 덕분에 스텝들이 뒷정리하기 수월해 보였다.
대회 후 아동학대 논란이 일어난 갓난아기를 안고 뛴 남성도 스쳐 지나갔는데 당시 나는 인파 사이를 추월해 지나가느라 그가 아기를 안고 뛰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홍콩마라톤은 흙을 밟는 구간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스팔트를 달리는 구간이었다. 고가도로가 무시로 등장했고 걷는 주자들이 속출했다. 우리나라 러닝대회는 주자들이 터널에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샤우팅을 내지르는데, 홍콩인들은 터널 속에서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내면서 비교적 조용히 통과했다.
주룽반도와 홍콩섬을 잇는 해저 터널을 두 발로 통과할 수 있는 경험도 했다. 3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햇볕이 뜨거워 땀이 많이 났는데, 마침 다리 위를 달리는 코스가 자주 등장했고, 바닷바람이 거세서 땀이 순식간에 말랐다.
마지막 업힐 구간을 지나 1㎞를 남긴 지점부터는 거리 응원행렬이 뜨거웠다. 피니쉬 지점인 빅토리아 공원까지 달리는 내내 시민들이 손바닥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해줬고 광둥어로 힘내라는 뜻인 것 같은 "꺄오"를 연호해 줬다.
피니쉬 후에는 스텝들이 바나나와 물을 원하는 만큼 줬다. 제한 시간은 6시간이었고, 내 완주 기록은 약 4시간 40분이었다. 씻을 곳이 딱히 없어 주변에 붐비는 화장실이나 식당 화장실, 미리 준비해간 바디티슈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참가할 일이 있으면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비교적 여유 있는 하프 코스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날 낮에 나처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마라톤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완차이 일대를 걸어 다니는 이들이 넘쳐났다. 헝그리 코리안이라는 한식당을 마주쳐서 완주 후 늘 하는 루틴인 '국밥' 한 그릇 먹으니 기력이 되살아났다. 주말을 활용한 1박 2일 홍콩마라톤, 괜찮은 경험이었다. 대회 종료 후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홍콩달러 399불에 구매해 보라는 권유 메일이 왔는데 자주 볼 것도 아니라 구매하지 않고 캡처했다.
40㎞ 이상 장거리 대회(마라톤 또는 트레일러닝)에 참가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달리기를 다신 안하고 싶어지고, 몇 주 동안은 달리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마라톤을 완주하고서 일주일 넘어서야 완주기를 쓰는 이유는 다소 시간이 지나야 달리기에 대한 환멸감이 사그라들고, 오히려 기억에서 미화되기 때문이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