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돌아오지 못한 이유 알고픈데…'기다리라' 답변뿐"
[제주항공참사 1년] 무안공항에 멈춰 선 유가족
대부분 약으로 버텨…기약 없는 참사 원인 발표에 분통
- 박지현 기자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아들은 여행을 좋아했다. 혼자 스페인까지 다녀올 만큼 경험이 많았다. 이번 여행은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첫 해외여행이었다. 연말 특가 항공권이 나왔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따뜻한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한다.
아들은 늘 그랬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도착했다"고 먼저 전화했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가든 빠뜨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24년 12월 29일 그날은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김영필 씨(71)는 "연락이 안 돼 이상하다고 느껴 전화를 걸었는데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왔다"고 말했다. 불길함이 스쳤다. 잠시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TV 틀어봐."
영필 씨는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일이 났구나."
짐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겉옷만 챙겨 사위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는 길 내내 '설마'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영필 씨는 "사고가 났다고 해도, 다 타버렸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영필 씨에게 이 1년은 기나긴 질문의 시간이었다.
영필 씨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기관도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다들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그는 "조사위를 만날 때마다 답변은 '기다려라'였다. 사고 초기에도, 1년이 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성철 씨는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그는 지금도 무안공항에서 지내고 있다.
성철 씨는 "집에 들어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공항에 머문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 활동에 매달리고 있다. 집에 남은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자책했다.
70대 유가족 A 씨는 매주 일요일 무안공항 분향소 앞에 선다. 그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열어주는데 그 시간만큼은 숨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아들은 KIA 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소속 직원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와 함께 탑승했다가 희생됐다. 자녀의 나이는 세 살이었다.
A 씨는 최근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1229개의 리본을 무안공항 활주로 철조망에 다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는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50대 B 씨는 사고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 4일에 한 번꼴로 무안공항을 찾는다. 그는 "잠들었다가도 깜짝 깨는 일이 반복된다"며 "하루 3시간 자면 많이 잔 것"이라고 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B 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으로 버티고 있다. 아직도 아내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여잡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건 '공청회 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다.
유족들은 "일부에서는 왜 유족들이 공청회를 막느냐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유족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 원인이 발표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공청회 전 조사 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달라는 게 바라는 전부"라고 말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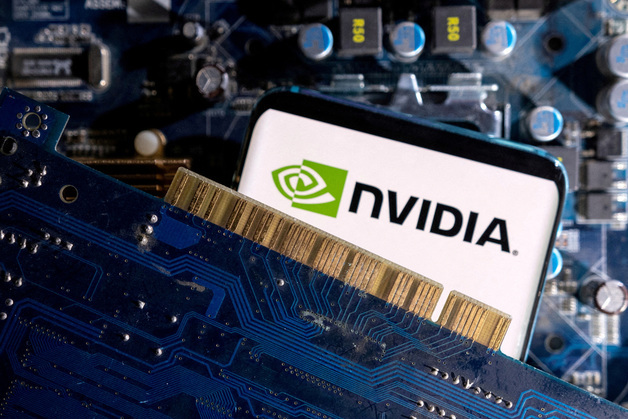


편집자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 사고를 넘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되묻게 한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는 4편에 걸쳐 유가족의 고통, 형사 책임 규명을 둘러싼 수사, 사고 원인 조사 기구의 한계,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의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