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의 섬, 세상의 별 ⑫] 말들의 섬…대마도(大馬島)
'말재'를 넘던 말 울음소리가 '오복여'로 솟은 해당화 섬
자연산 미역 채취가 끝나면 멸치떼…어한기엔 우럭과 돔
- 조영석 기자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조선시대 말 목장이 있던 섬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대마도'는 큰 말을 키우던 곳이고, 인근의 '소마도'는 작은 말, '관청도'는 우마장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온다. 말을 기르던 마을 뒷산은 '마장(馬場)'이라는 지명으로 남고, 고갯길도 '말재'라 부른다.
지형이 큰 말처럼 생겨서 대마도라 불렀다고도 하지만 말보다는 헤엄치는 해마의 모습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다.
들락날락 복잡한 해안선은 길이가 14.5km에 달한다. 북동쪽 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깎아지르는 해식애가 발달했다.
면적 2.8㎢의 제법 큰 섬으로 1973년도에는 197가구 1153명이 살았다. 2025년 3월 말 현재 58가구 86명이 살고 있다.
학교의 역사가 섬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인구가 많던 1963년, 조도초등학교 대마분교가 대마초등학교로 승격하고 학생 수가 246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1990년 다시 분교로 격하돼 '1 학생, 1 선생님'을 거쳐 지난 2023년부터 휴교 상태다.
대마 1, 2구의 2개 마을이 있다. 주민들은 1구 마을을 '대육'이라 부르고, 2구 마을은 '대막'이라 부른다. 1구 대육이 38가구, 58명으로 2구 대막에 비해 좀 더 크다.
대마도의 들머리인 동북쪽 선착장에 내려 500m쯤 걷다 보면 활대처럼 휘어진 오른쪽 해안도로를 따라 대육마을이 펼쳐지고, 1km쯤 더 가면 해안도로 끝에 대막마을이 자리한다. 두 마을을 잇는 해안도로에는 해당화가 잘 가꾸어져 있다. 대마도는 예전에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 '해당화 섬'이라고도 불렸다.
선착장 앞 바다에서는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인 '오복여'가 뉘엿뉘엿 전설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암초는 100여 년 전, 어느 날 무리 지어 부스럼처럼 갑자기 솟아났다고 전해진다. 선착장 근처에 대육마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불길하게 여겨 지금의 자리로 마을 터를 옮겼다고 한다.
본래 대육마을이 있던 곳에 대마초등학교가 있었다. 초등학교도 '오복여'를 피해 터를 옮겼다면 무탈했을까하는 상상은 터무니없다.
대마도에는 '오복여'말고도 서북쪽 해안을 이루고 있는 낭떠러지 절벽에 처첩과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룬 두 가지의 전설이 얹혀 있다. '절벽'의 전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처럼 비극이다.
"함께 마장산으로 나무하러 간 작은 어미가 큰 어미의 머릿니를 잡아주겠다며 절벽 위에 큰 어미를 앞세워 앉았다. 미심쩍은 큰 어미가 몰래 자신의 옷고름을 작은 어미의 옷고름과 한데 묶었다. 뒤에 앉았던 작은 어미가 앞에 있던 큰 어미를 절벽 아래로 밀었고, 옷고름으로 묶인 둘은 결국 같이 떨어져 죽었다. 처첩이 떨어져 죽은 바위를 '딴동네골'이나 '시앗굴 개안'이라고 한다." 대육마을 김성자 씨(88)가 시할머니에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다.
첩을 가리키는 '시앗'이라는 말은 대막마을 뒤 '시아시 해변'에서도 읽힌다. '시아시'가 '시앗'과 같은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
"옛날에 장오딸이라는 절세미인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바다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그리움과 비통에 빠져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 절벽을 '장오딸이 빠져 죽은 곳'이라고 하여 '장오딸 빠진골'이라고 한다."
해안가에는 '사랑개비 빠진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 "옛날에 대마도에 장오딸이라는 절세미인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바다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그리움과 비통에 빠져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 절벽을 '장오딸이 빠져 죽은 곳'이라고 하여 '장오딸 빠진골'이라거나 '사랑개비 빠진골'이라고 한다." 주민들마다 골짜기의 이름이며 내용을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큰 줄기는 하나로 이어진다.
대마도는 여느 섬마을과 다를 바 없이 마을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일흔 고개를 훌쩍 넘어서면서 마을 전설들도 함께 사위어 가고 있다. '오복여'와 '시앗굴 개안', '사랑개비 빠진골'은 물론이고 '시아시 해변'등의 전해오는 얘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마을의 역사와 함께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만입 된 마을 앞바다는 썰물 때 갯벌로 변하고, '마미동'과 '방막터', '시아시'라고 부르는 해변은 잔잔한 파도와 함께 백사장이 발달했다. 대막마을의 오른쪽 끝에 위치한 방막터는 조도면 일대에서 맛조개가 나오는 해변으로 유명하다.
대육마을 뒷산너머 마미동은 물이 귀한 대마도 주민들이 샘물을 길어 나르던 곳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닐곱 집이 있어 사람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쇠락했다. 대마도에는 지난 6월 식수 전용 저수지가 준공돼 물 걱정을 덜었다.
대마도의 최고봉인 돈대봉(179m) 부근에 '머리얹은 바위'라고 부르는 둥근 바위가 서해 바다로 금세라도 떨어질 듯 '흔들흔들' 절경을 이루고, 우리나라 박쥐 가운데 최장수(최대 30년) 종으로 알려진 관박지 200여마리의 서식지가2018년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 섬의 특성과 가치를 담아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갈등으로 중단됐다.
이른 여름 톳 생산이 끝나면 미멱 채취 차례가 오고, 미역 농사가 마무리될 때쯤 앞바다에 멸치떼가 몰려온다. 주민들은 멸치잡이까지 끝나 찬바람이 몰아오는 어한기가 되면 바다로 나가 장어, 농어, 우럭을 잡는다.
보리와 고구마 등을 주로 심었던 밭뙈기는 예전의 식량 생산이라는 기능을 잃고 배추나 고추를 심는 남새밭 역할로 전락했다. 산을 깎아 조성했던 농지는 주민들의 고령화와 멧돼지 떼의 기승으로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닭과 염소 등 가축까지 잡아먹는 맹수로 변한 지 오래지만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대마도는 자연산 돌미역과 톳, 멸치 등이 주 소득원이다. 다행히도 이들 물산은 한꺼번에 나오기보다는 들고남의 순서를 지켜가며 주민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 준다.
이른 여름 톳 생산이 끝나면 미멱 채취 차례가 오고, 미역 농사가 마무리될 때쯤 앞바다에 멸치떼가 몰려온다. 주민들은 멸치잡이까지 끝나 찬바람이 몰아오는 어한기가 되면 바다로 나가 장어, 농어, 우럭을 잡는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밭에서 봄쑥을 재배했으나 지금은 서너 가구만 명맥을 잇고 있다. 철 따라 바뀌는 섬의 일상은 바뀌지 않는 삶의 일상으로 대마도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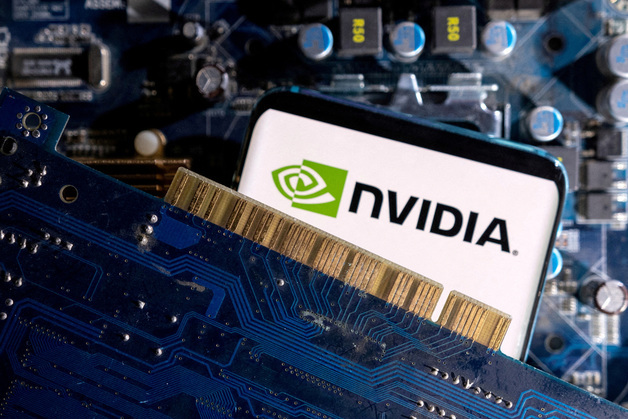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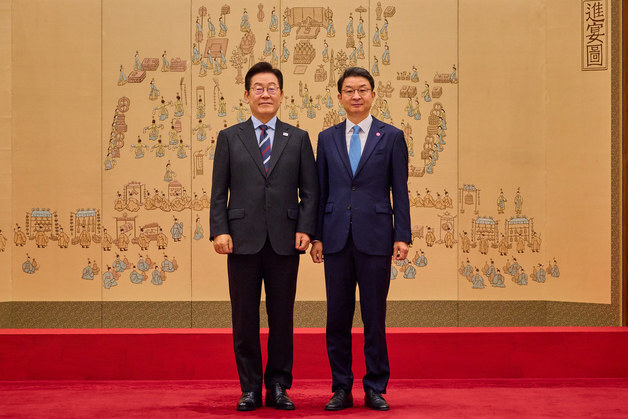
편집자주 ...'보배섬 진도'에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보배'가 많다. 수많은 유·무형문화재와 풍부한 물산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삼별초와 이순신 장군의 불꽃 같은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하지만 진도를 진도 답게 하는 으뜸은 다른 데 있다. 푸른 바다에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섬들이다. <뉴스1>이 진도군의 254개 섬 가운데 사람이 사는 45개의 유인도를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대항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