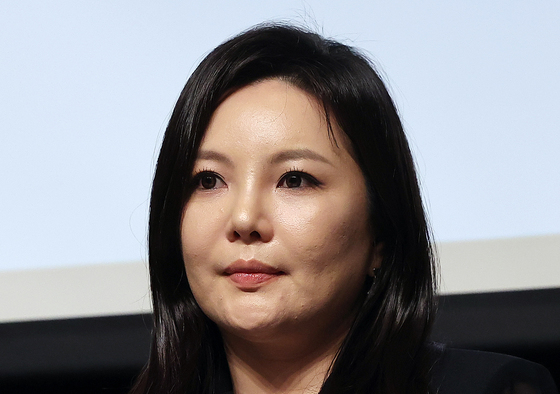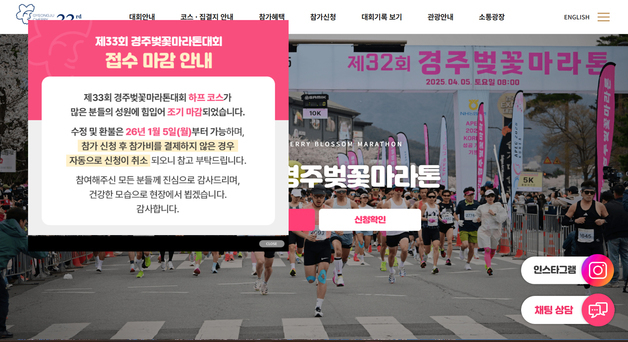경기 불황 속 '자동차 재생 배터리' 뜬다
전문가 제작 제품 안전…"규제·인증제도 절실"
최근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47)는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했다. 배터리 수명이 다해 시동이 켜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만~1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이씨의 차는 10년도 넘은 구형이었다. 결국 이씨는 찝찝하긴했지만 정가의 30%대인 재생 배터리를 구입했다.
이씨처럼 자동차 재생 배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전문 매장도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재생 배터리란 말 그대로 폐기된 중고 배터리를 재활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재생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대신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든다.
일부 카센터 업주들도 "수명이 짧고 부작용이 우려 돼 정품 새 배터리만 취급한다"며 재생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를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은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 대부분 "재생 배터리 사용은 권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래 전부터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에 재생 배터리가 사용돼 왔지만 큰 문제없었다. 수명이 짧다는 것 말고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재생 배터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곽영훈 (사)한국배터리자원순환협회 사무총장도 "네비게이션·블랙박스 등 차내 전자장치가 늘어 나면서 그만큼 배터리 교체 시기도 짧어 졌다. 이같은 추세에 발 맞춰 재생 배터리를 활용해 2~3년 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재생 배터리는 폐기된 배터리에 전기적 방식으로 +,-단자를 바꿔주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배터리 내 황산염 제거, 납전지판 교체 등으로 만들어 진다.
이 교수는 "다만 전문가가 생산한 재생 배터리만 사용해야 한다"며 "재생 과정에서 작은 실수만 생겨도 차에 문제가 생겨 대형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의 40%는 전자 부품으로 이뤄져 있다. 비 전문가가 만든 재생 배터리 사용 시 전자 부품에 결함이 생겨 시동이 켜지지 않거나 운행 중 시동꺼짐, 브레이크 미작동 등을 빚을 수 있다.
이 교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는데다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재생 배터리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 재생 배터리 안전에 관한 규제·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정부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폐배터리 중 재생가능 여부를 구분해 주는 선별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협회 차원의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납성분으로 이뤄진 배터리를 폐기할 때마다 환경 오염이 가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생 배터리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되 사후관리와 보증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