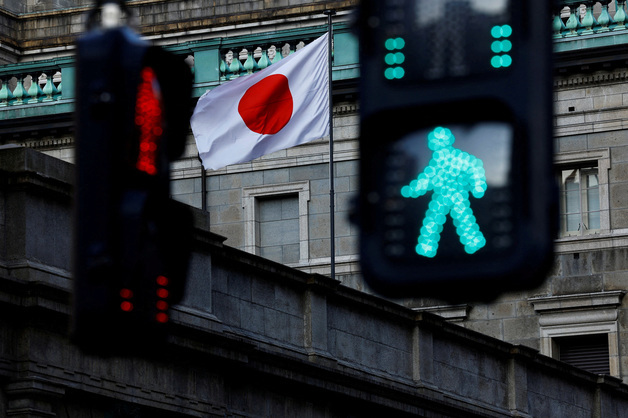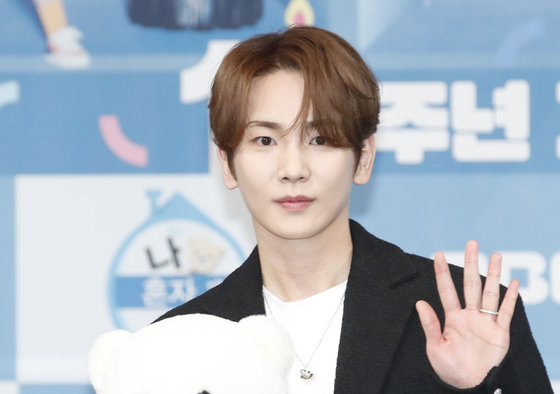[신용석레인저가떴다]철쭉의 바다 건너니 안개·구름바다…이름도 반가운 만복대도 반기네
지리산 서북능선 종주
바래봉~팔랑치~정령치~만복대~작은고리봉~성삼재 '사색의 길' 22㎞
(서울=뉴스1) 신용석 객원기자 = 지리산 지도를 펼쳐보면, 노고단에서 천왕봉을 잇는 주능선만 지리산 종주로 삼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삼재 왼쪽으로 22㎞에 이르는 서북능선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더구나 그 일부는 백두대간이라는 '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북능선 길을 지리산 주능선과 동쪽 산청군 웅석봉 지맥에 연결하면 태극무늬가 나온다 해서 태극종주라 한다. 그러나 이 코스 중 천왕봉 옆 중봉에서 하봉-왕등재 샛길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중봉에서 써리봉-치밭목-대원사에 이르는 탐방로를 타고 종주를 마무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63㎞에 이르는 이 길도 태극 모양을 띤다.
◇'서북능선' 인월-성삼재 22㎞ "지리산의 또 다른 표정"
서북능선의 들머리는 인월이다. 고려 말 인근 황산벌판에서 이성계가 왜구와 싸울 때 더 많은 화살을 쏘려고 달(月)을 끌어와(引) 밤을 밝혔다고 인월이라 부른다. 옛 인월 마을이 끝나는 숲 가장자리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3.6㎞ 지루한 오르막을 올라 당도하는 서북능선 첫 번째 봉우리 덕두산(1150m)은 '산'이라 할 것도 없이 협소하다. 여기서 1.4㎞를 더 올라서야 서북능선의 상징적 봉우리인 바래봉(1186m)에 도착한다.
바래봉의 '바래'는 봉우리의 뭉툭한 모습이 스님들 밥그릇인 바리때를 엎어 놓은 모양이라는 뜻이지만, 내게는 '바라본다'의 뜻으로 들린다. 그만큼 기가 막힌 풍광이 쫙 펼쳐진다. 동쪽 정면으로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주능선 실루엣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 서북능선길이 만복대 너머까지 첩첩하다. 웅장하고 웅혼하다. '오~!, 와~!' 가슴이 뻥 뚫린다.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세석철쭉은 연분홍 빛으로 곱고 우아한 반면 바래봉 산철쭉은 진분홍 빛으로 정열적이고 화려하다. 세석철쭉은 무분별한 야영과 훼손으로 망가져 다른 나무들에 밀리고 있지만, 바래봉 산철쭉은 마치 정원사가 다듬어놓은 듯 확실한 군락을 이룬다. 그 정원사는 양이다. 1970년대 이곳에 방목된 양들이 독성분이 있는 산철쭉만큼은 건드리지 않아 산철쭉만 번성했다. 바래봉을 비롯해 주변 산길이 모두 널찍한 이유는 양들의 이동로였기 때문이다. 서북능선 종주로는 대부분 검은 흙길이고 푹신하다. 화강암이 큰 압력과 열을 받아 부드러워진 게 편마암이다. 편마암이 많은 지리산은 흙산이고, 화강암이 많은 설악산과 북한산은 돌산이다.
바래봉에서 30분 거리에 산철쭉 군락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팔랑치(八郞峙)가 있다. 지리산 역사에서 사람의 첫 흔적은 2100년 전이다.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지리산에 들어와 달궁(현재 심원계곡의 달궁마을)을 지었다는데, 이때 장수를 8명을 보내 지키게 했다는 고개가 팔랑치다. 팔랑치에서 부운치(浮雲峙)까지 30분쯤 걷는 능선 길은 말 그대로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산 아래에 구름이 자욱하다. 치(峙)는 우리말로 고개·재·목을 말하는데, 유독 서북능선에 '치'고개가 많다. 부운치에서 세동치까지 약간의 오르막을 올라 곧 세걸산을 만난다.
세걸산 정상(1220m)은 밋밋하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서북능선과 지리산 주능선의 파노라마 같은 조망을 담기 위해 배낭을 벗는다. 서북능선에서는 경관이 열렸을 때 충분히 조망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안개와 구름이 몰려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서북능선의 오아시스 정령치휴게소…"일출·일몰도 예술"
세걸산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한 시간 반쯤 거리에 또 하나의 전망대 고리봉(1304m)에 다다른다. 이름 뜻을 알아보니 "남원의 형상이 물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이라, 이 고리봉과 성삼재 직전 '작은고리봉'에 밧줄을 묶어 남원을 떠내려가지 않게 보전했다"고 한다. 고리봉에서 서쪽으로 난 하산로는 남원의 여원재를 거쳐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길이다. 고리봉에서 여원재로 내려서는 초입 1㎞는 매우 가파르고 낙엽이나 눈이 덮이면 길 자국이 희미해 주의해야 한다.
고리봉에서 급한 길을 내려서면 곧 정령치(1172m)다. 바래봉을 제외하면 샘이 없고 대피소도 없는 서북능선에서 정령치휴게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남원역에서 이곳까지 오전 오후 한차례씩 올라오는 버스가 개설돼 서북능선을 쉽게 오르거나 끊어서 종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여기서 천왕봉 방향 일출과 반대편 남원 방향 일몰 풍경도 일품이다. 정령치주차장에 차를 대고, 고리봉에 올라 지리산 전체를 일견한 후, 인근의 마애불상과 고산습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지리산을 다녀왔다!”고 할 수 있다.
정령치 도로는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끊고 자연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정령치 도로 꼭대기를 터널화하고 흙을 덮어 백두대간의 맥을 이었다. 그러나 이 터널의 상부를 야생 동물통로와 사람통로(등산로)로 같이 쓰고 있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야생동물 발자국과 흔적을 조사해 도로에 의해 끊어진 지점마다 이동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정령치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한 시간쯤 걸어 올라 서북능선 최고봉인 만복대(萬福臺·1438m)에 도착한다. 이 펑퍼짐한 고원에는 먹거리와 약초가 풍성해 복이 많다고 '만복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만복대에서 바라보는 건너편 반야봉은 '반야산'이라 할 만큼 우람해 독립적인 하나의 산이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 지리산 주능선 어디서 보든 두 개의 엉덩이가 불룩하게 엎드린 형상이던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산은 보는 방향이나 기상,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만복대를 내려서면서부터는 좁은 길 가장자리에 빽빽이 들어찬 나뭇가지를 잘 통과해야 한다. 숲 가장자리에 늘어선 철쭉, 싸리나무, 미역줄나무, 졸참나무, 산죽 등이 자꾸 배낭을 붙잡거나 팔뚝에 상처를 낸다. 아침이라면 좁은 길에 무성한 나뭇잎과 풀이 머금은 이슬로 온몸을 적시는 '이슬 샤워'를 하게 된다.
◇'작은고리봉'서 보니 아득해진 서북능선 "발아, 고마워"
'나홀로 산행'을 하는 산꾼이 성큼 다가와 "안녕하세요" 하고 재빨리 스쳐 지나간다. 그 찰나의 눈빛과 주름, 옷차림과 땀내, 배낭의 크기만으로 상대방을 파악한다. 등산 교과서에 산은 혼자 가지 말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가끔 자기가 잘 아는 산이라면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단독산행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만 있는 곳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다.
성삼재에 이르는 마지막 봉우리 '작은고리봉(1248m)'에 올라 지나온 서북능선을 바라보니 구름인지 안개인지 시야를 가려 더욱 아득한 산줄기다. 저기 저 끝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고개 숙여 발에게 존경을 표해 본다.
차 소리, 사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곧 너른 아스팔트와 주차장과 휴게소 건물이 나온다. 지리산 서북능선의 종점인 성삼재(1102m)다. 여기서 노고단 방향으로 종주를 이어가든지, 산행을 종료하고 버스를 타든지 해야 한다. 성삼재서부터 종주하기 위해 버스나 승용차로 새벽에 도착하면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쏟아져 탄성을 지를 때가 많다. 그러나 고갯마루의 바람이 세차기 때문에 서둘러 이동해야 한다.
성삼재에서 남원과 구례를 잇는 지방도는 애초 군사도로를 관광도로로 확장해 조성했다. 이제는 지리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성삼재에 있는 시설들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리산 서북능선! 이 길은 한쪽으로 지리산의 웅장한 주능선을 우러르고, 한쪽으론 민족의 기상이 배어있는 백두대간과 황산 벌판을 내려다보며 걷는 순례의 길이다. 이따금 사람을 만날 수도, 온종일 못 만날 수도 있는 적막한 길에서 온전히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유의 길이다. 지리산 서북능선! 주능선과는 확실히 다른 또 하나의 지리산이 여기 있다.
stone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