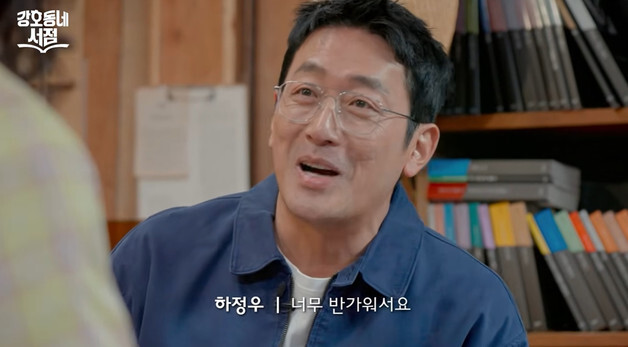독일 제국의 탄생과 세계대전의 서막…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이야기
[신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870-1871'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프랑코-프로이센 전쟁은 유럽의 힘 지도를 바꿨다. 신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870-1871''은 비스마르크의 여론전부터 스당의 항복, 파리 포위와 코뮌까지 전쟁의 전말과 여파를 최신 연구로 재구성한다.
책은 보불전쟁을 워털루와 세계대전 사이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문을 연다. 참전 병력 200만 이상, 전사·사망 18만 이상. 그 사이 독일은 통일했고 프랑스는 공화정의 토대를 닦았다.
프랑스 패권의 퇴장과 독일의 등장이라는 대전환이 유럽 질서를 재편했다는 점을, 저자는 전투·외교·동원·일상의 층위로 눌러 쓴다.
출발점은 엠스 전보 사건이다. 에스파냐 왕위 공백을 둘러싼 갈등이 비스마르크의 편집·공표로 여론전에 불이 붙고, 프랑스가 선전포고로 응수한다. 그러나 철도·동원 체계·참모 시스템 같은 '전쟁의 조직화'에서 앞선 프로이센이 주도권을 잡는다.
초반 전투의 양상은 명확하다. 8월 6일 프뢰슈빌레르·스피셰렌에서 프랑스군은 샤스포 소총의 화력으로 버텼다. 하지만 프로이센은 병력을 집중해 전선의 빈틈을 찔렀고, '상황 맞춤 이동'으로 좌우를 비틀어 전환점의 문을 열었다. 두 달 뒤 스당에서 나폴레옹 3세가 항복한다. 황제의 백기와 함께 프랑스 제2제국은 막을 내린다.
스당 이후의 장면은 군사사가 정치·사회사와 겹친다. 9월 4일 파리에서 무혈 혁명이 일어나 국민방위정부가 성립했고, 도시는 포위에 들어간다. 새 정부는 전쟁 지속을 선언하지만 전략·보급·외교의 불리함은 견고했다. 포위된 파리는 하늘을 택한다. 열기구 우편이 정기 운항을 시작하고, 도시는 공중을 통해 소통·정찰·사기 유지를 꾀한다.
전쟁은 병영 울타리를 넘어 일상에 스며든다. 피난길 여성의 불안, 스파이에 대한 과잉 상상, 길 위 검문과 동행 같은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체험 기록이 이어진다.
베르사유에서는 독일 제국 선포라는 다른 무대가 오른다. 통일은 정복이라기보다 프로이센이 축적한 힘을 시각화한 연출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인 처벌과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파르티잔 공포 속에서 마을이 불타고, 인질과 혹한의 고통이 기록된다.
종전 국면에 접어들자 파리는 '피의 주간'이라 불리는 시가전을 겪고, 파리 코뮌은 진압된다. 저자는 보불전쟁을 세계대전의 예시로 읽는다. 민족주의의 격발, 전국가적 동원, 대량 살상기술, 민간인 피해의 제도화—20세기 총력전의 요소가 이미 모였다.
저자는 단선적 인과를 경계한다. 보불전쟁에서 1914년으로 곧장 이어지기보다 비스마르크의 균형 외교을 중심으로 양국 내부 정치의 변동이 직접 연결선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군국주의 상징 자본과 모방 경쟁, '전쟁의 조직화'가 남긴 제도·문화의 유산이 20세기의 비극을 잉태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870-1871: 독일 제국의 탄생과 세계대전의 서막/ 레이철 크라스틸 지음·이진모 옮김/ 책과함께/ 원제 'Bismarck's War'/ 4만 3000원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