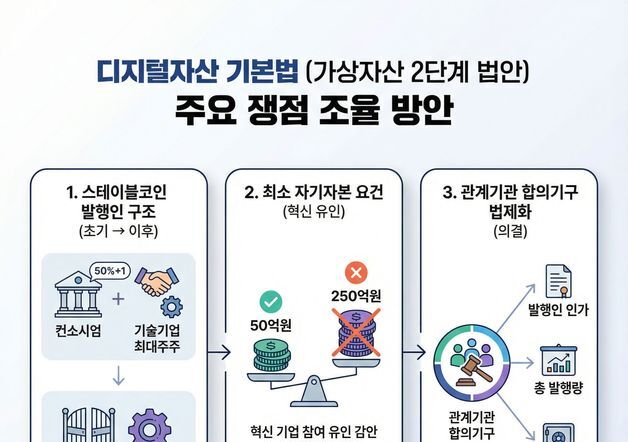노세일 고집 버리고 1+1 반값할인…스킨푸드 3년연속 '적자의 늪'
조윤호 대표 '정직한 가격' 고수하다 '현실의 벽'…결국 생존 선택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화장품 브랜드숍 스킨푸드가 '노세일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정직한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이를 포기하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벌였지만 한 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랜드숍 3위→순위권 밖으로…업계 "노세일 역효과"
2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스킨푸드 연결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690억원으로 전년 수준(1640억원)이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2억원, 71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스킨푸드는 2014년 적자전환(52억원)했고 2015년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129억원으로 늘었다.
스킨푸드의 악화된 실적에 대해 업계에서는 2014년까지 '노세일 정책'을 고수하며 업계 관행과 정면승부를 벌이다 오히려 충성 소비자층을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으로 봤다. 이 시기 경쟁브랜드숍들이 자연주의 콘셉트와 할인마케팅 경쟁을 벌여 스킨푸드 고정고객층을 빼앗아 갔다는 해석이다.
할인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시하는 방식은 브랜드숍 업계의 관행으로 굳혀진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킨푸드는 중저가화장품 브랜드숍 시장에서 정직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미지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브랜드가 매우 다양해지고 서로 치열한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빼앗기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킨푸드는 할인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히트시키면서 승승장구했다. 2004년 설립돼 6년 차인 2010년 매출 1651억원,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에뛰드하우스 등 경쟁브랜드에게 잇따라 밀려나면서 성장이 정체됐고 수익성도 급격하게 악화됐다. 2012년 114억이던 영업이익은 다음해 32억원으로 줄었다.
급기야 2014년 매출은 1740억원으로 전년(1850억원)보다 쪼그라들고 5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브랜드숍 순위에서도 6위로 밀려났다. 노세일 정책을 밀고나갈 정도로 콧대가 높았던 스킨푸드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스킨푸드의 적자규모는 2015년 129억원으로 더 늘면서 당기순손실 205억원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판매촉진비(39억원→101억원) 외주용역비(67억원→112억원) 등을 늘려 할인행사 외 마케팅 강화로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장품 로드숍 연중세일 경쟁에 꺾인 브랜드정체성
스킨푸드는 결국 2015년 3월 5일부터 노세일 정책을 접고 할인행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당시 '스킨푸드 첫 세일로 전 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는 홍보 문구가 걸렸다. 스킨푸드가 전 제품 대상 할인행사를 연 건 창립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언급됐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자 생존을 위해 신념을 버리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쉽지 않은 결심을 했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미 경쟁브랜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해외 매장 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가 줄었다"며 "올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스킨푸드를 창립하며 '처음부터 정직한 가격으로 365일 노세일 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할인행사를 열지 않는 정책을 고수했다. 화장품을 언제 구입하더라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고정고객층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매심리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이상을 추구한 것이겠지만 현실은 고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