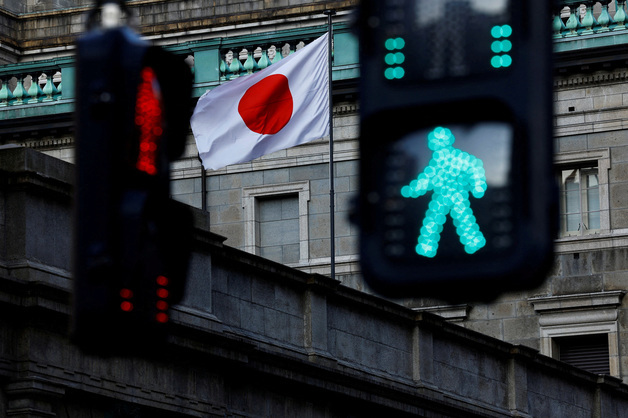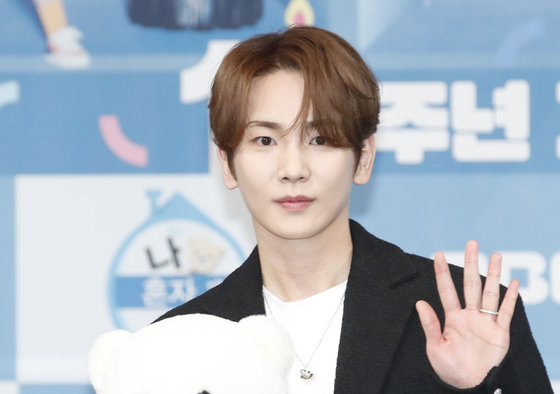"미전실은 아니라도"…컨트롤타워 부재 깊어진 고민[이재용 시대 1년⑤]
미전실 해체 후 6년간 '자율경영'…M&A·미래 사업 추진력 떨어져
준법위에서도 컨트롤타워 '부활' 의견…"미전실 과오 막을 장치 필요"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60개 계열사를 가진 연매출 300조원, 시가총액 400조원의 글로벌 기업이 된 배경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지 않았다.
'관리의 삼성'이란 별칭답게 1959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조직관리에 강한 일본 미쓰비시와 미쓰이를 벤치마킹해 20명 안팎의 비서실을 꾸렸다.
이땐 의전기구 수준에 불과했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명칭은 비서실, 구조조정본부(구조본),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미전실) 등으로 바뀌었고 '삼성의 청와대'라 불리며 그룹의 조타수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2017년 2월 마지막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국정농단 여파로 공식 해체된 이후엔 사실상 자율경영 체제를 선택했다.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3개의 태스크포스(TF)가 맞물려 돌아가며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전략기획실이 해체되고 2년 뒤 2010년 미전실로 재탄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재계 안팎의 분석이 많았지만 6년째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년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을 즈음해 컨트롤타워 복원에 대한 관측도 나왔으니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묶인 상황인 만큼 삼성 입장에선 컨트롤타워 부활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서는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공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정경유착 근절 등 경영 쇄신을 외치며 미전실을 해체했는데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부활은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일류 기업의 초격차, 투자, 미래 먹거리 발굴이 좀처럼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오, 배터리 등은 모두 2010년 미전실이 존재했던 시기에 키운 사업들이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시작으로 올해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적자까지 겹치면서 삼성 안팎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하다.
자율경영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략·기획·진단·M&A(인수·합병) 관련 기능을 각 계열사에 맡기다 보니 사업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조직이 없는 것이다. 굵직한 M&A도 멈췄다. 5년간 IR 때마다 '유의미한 M&A'를 언급했지만 내세울 만한 '빅딜'은 없었다.
조타수 부재는 삼성 내부뿐 아니라 '감시자'에게서도 언급되고 있다. 삼성의 내부 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마저도 컨트롤타워 부활에 힘을 싣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이 회장과 면담 이후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을 전제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8월에도 인터뷰에서 "작은 돛단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라며 "많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효율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컨트롤타워 부활엔 과거 미전실 해체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권력 집중 등의 역효과를 막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적 근거·효율성·투명성이 모두 전제되는 조직 구조를 찾아야 하는 것도 과제다. 컨트롤타워가 부활할 경우 지배력 분산, 준법경영 약속 등 주주 설득을 위한 메시지가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배구조 개편도 남아있는 큰 숙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회장(17.97%)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31%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현재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해 책임경영을 위해선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언제나 옳은 정책이 없듯이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시장 변동 주기는 빨라졌는데 리더십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 공감한다"며 "결국 이 회장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