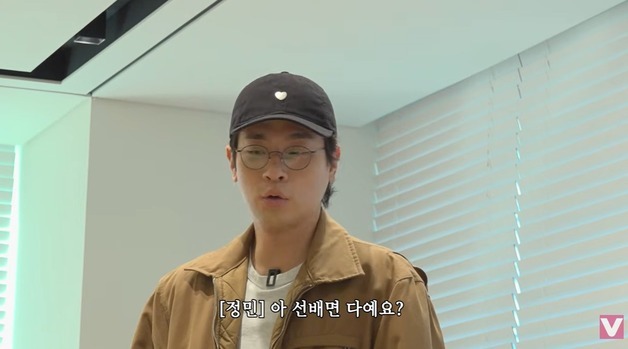폐가구 무상수거 10개월…무엇이 달라졌나
"주민들 반응 긍정적"…폐가구 양성화·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여부 변수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정부가 올해 폐가구 무상수거 정책을 도입한지 약 10개월이 지났다.
폐가구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재활용가구 기준과 같은 개선사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가구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4~5곳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전남 순천시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티커 비용까지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주민들은 스티커를 붙인 폐가구를 지정수거 장소에서 버려야 했다.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거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 가구를 대신 버려준다. 서비스는 가구를 운반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혜택도 크다. 3000원에서 3만원선인 스티커 비용만 내고 별도 운반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민간수거업체 이용가격 보다 훨씬 저렴하다. 지자체를 통해 장롱을 버릴 때 사야하는 스티커 가격은 3만원이다. 반면 A민간청소업체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장롱을 버리는 가격으로 15만원(가구해체 비용 포함)을 받고 있다.
가구업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현재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가전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따르면서 연간 60억원 가량을 무상수거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재활용가구 시장의 양성화 가능성이다. 지자체가 수거한 폐가구는 폐기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가 된다. 상태가 양호하거나 수리를 거친 제품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진다. 재활용 가구로 사용할 지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함 제품의 경우 사용 상 안전이나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가구로 볼 지, 재활용가구로 볼 지 기준은 정해진 게 없다"며 "브랜드 가구회사가 제조공정을 마친 후 문제가 있는 가구를 전량 폐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게다가 가구업계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상수거 서비스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환경부가 중앙정부를 통해 예산지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한다면 가구회사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이행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수순이 이어질 수 있다. 영세한 가구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가구업체(근로자 5인 이상)는 1343곳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10조757억원에 달하지만 연매출이 100억원을 넘긴 곳은 7.2%에 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구회사가 폐가구 유통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느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연말에 정책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시범사업 지자체별로 관련 비용은 연간 5000만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스티커 관련 수입도 늘고 있어 지자체장들의 의지만 있으면 서비스는 안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gm1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