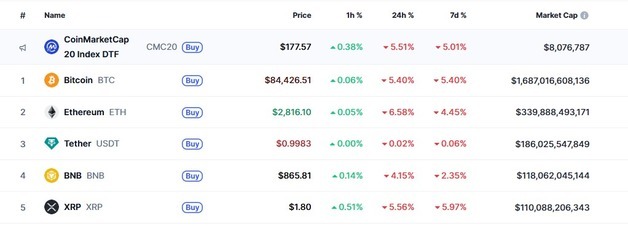2026년 '1000스닥' 2000년 '닷컴버블'과 다른 이유 [손엄지의 주식살롱]
2000년 3월 코스닥 2800 찍고 연말까지 80% 넘게 폭락
코스닥 PER 마이너스에서 7000배 넘는 기업까지…사업 본질에 집중해야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코스닥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바로 2000년 3월 2800선까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이 '25년 8개월 만의 최고치'라고 하는 이윱니다.
1990년대 말은 새천년을 앞두고 지금의 인공지능(AI)처럼 정보기술(IT)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과 PC 보급은 노동생산성의 혁명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온라인 공간은 정보 격차를 줄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야후 같은 기업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IT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정부는 벤처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웠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한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새롬기술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점유했습니다. 주가수익비율(PER)이나 현금흐름보다 트래픽과 회원 수, 그리고 '비전'이 주식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면 현금을 준다"는 골드뱅크는 1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무료 인터넷 전화'를 앞세운 새롬기술은 150배 급등했습니다.
이때 증시는 반등이 아니라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손에 쥔 중장년층이 증시로 유입됐습니다. 주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바심이 사회 전반에 번졌습니다.
한국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400% 상승했고, 2000년 3월 최고점을 찍기 전 6개월 동안 83%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주식시장은 흔들렸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은 2000년 3월 2800선을 넘었지만 그해 IT버블이 터지면서 연말까지 80% 폭락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졌고, 코스닥은 오랜기간 '성장 시장'이라기보다는 '도박판'이라는 이미지가 계속됐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코스닥을 둘러싼 장면들이 묘하게 겹쳐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문제는 기술보다 가격을 결정하는 논리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PER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물론 7000이 넘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2000년과 2026년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위험합니다. 당시는 수익모델이 희박한 사업이 상장과 자금조달을 통해 외형만 키우던 구조가 흔했고, 지금은 자본시장 허들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AI 수요가 실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버블 때 상장했던 엔씨소프트(036570), 다음(현 카카오(035720))의 기업가치는 그때보다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을 바라보는 냉정한 태도입니다. 상승세에 빨리 올라타지 못했다는 조급함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보다 10년 뒤에도 더 성장해 있을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IT버블 당시 주당 113달러까지 올랐다가 6달러로 추락했던 아마존은 현재 24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0대 1 액면분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가격으로 4800달러까지 오른 셈입니다.
e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