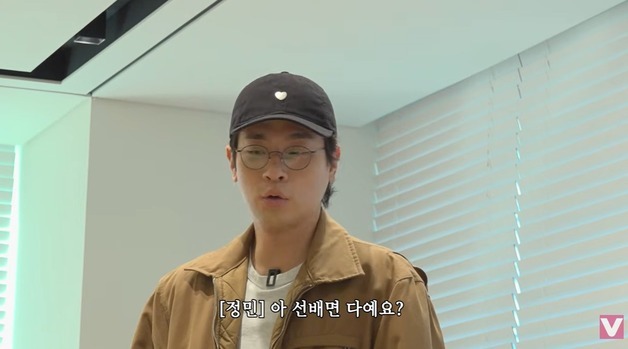"남들은 100억 아꼈다는데"…대환대출, DSR 족쇄 묶여 '난감'
DSR 초과 차주, 대출총량 유지하며 갈아타는 것도 안 돼
"취약차주 상당수가 DSR 초과…대환대출 도입취지 무색"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고금리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용액 5000억원을 넘어서며 차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연간 절약된 이자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한 차주는 대출총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자체가 차단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탄 대출액이 지난주 5005억원(총 1만9778건)을 넘어섰다고 실적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 기간 대환한 고객이 절감한 연간 이자 규모만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대출 관련 커뮤니티 등에선 금융당국의 실적 홍보와 실제 차주들이 느끼는 대환대출 인프라 접근성 사이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DSR 규제' 부분이다.
DSR은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어서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DSR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면서, DSR 비율을 초과한 차주는 대환대출 기회 자체를 아예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DSR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차주들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리게 한도를 제한해, 대출 상환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규제 목적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금리 시기에 차주들,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오히려 DSR 비율을 초과한 차주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경우, 이자 감소로 인해 대출 원리금 자체가 줄면서 DSR 비율도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출 관련 커뮤니티엔 "단순 대환은 대출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DSR로 막는 것이냐", "금리 경감이 절실한 저소득자나 다중채무자 상당수가 DSR 초과자일 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는 취약차주가 아닌 고신용 차주만을 위한 대책이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지난 4분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3명이 DSR 40%가 넘는다. 특히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취약차주의 경우 10명 중 6명이 DSR 4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초과 차주가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한도를 늘리려 할 경우엔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대출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갈아타는 것까지 막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합리적인 선에서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