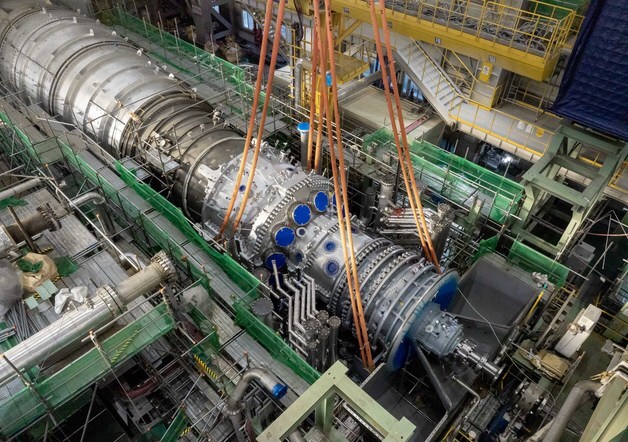근로자 입증 책임 사용자에 넘겼지만 '기준'은 안갯속…'소송대란' 오나
"862만 사각지대 해소 발판"… 5월 1일 '노동절 입법' 속도전
"기준 없어 분쟁 폭증 우려…경영 부담에 '고용 위축' 부메랑"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의 판도를 바꿀 '노동자추정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인 5월 1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입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유지된 '근로자 입증 책임' 원칙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뒤집는 대전환이다.
당장 플랫폼 종사자 등 862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의 법적 분쟁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영 부담 가중에 따른 '고용 위축' 시나리오가 겹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자추정제의 핵심은 분쟁 발생 시 '노동자성'의 입증 주체를 180도 바꾸는 데 있다. 그간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은 사장이 숨긴 근태 자료나 업무 지시 메일을 노동자가 직접 찾아내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한계'에 부딪혀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한다.
사장이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가 일괄 적용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플랫폼 노동 지침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ABC 테스트'와 궤를 같이하는 흐름으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제도 시행 시 가장 큰 우려는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다. 이번 입법안은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획일적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호한 기준을 둔 채 '입증의 주체'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기업들의 입증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만 해도 종류가 다양한 데다 업무형태나 플랫폼의 지휘·감독 수준이 서로 달라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모호해 노동자성을 따지기 더 난해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쟁 발생 시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본다. 결국 확정된 기준이 없으니 노사 양측 모두 일단 법적 판단을 구하고 보는 '소송과 진정의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비대해진 권한은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발단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인하려 해도, 감독관이 국세청 과세 정보 요청권과 자료 제출 강제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입증 책임만 전환되면, 현장에서는 매 사건이 격렬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영계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감독관의 주관적 판단과 강력한 조사권에 기업 경영이 휘둘릴 수 있다"며 분쟁 비용 가중에 따른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입법을 자신하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다. 862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지위 변화가 예고된 만큼,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고용 절벽'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의 성패는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업종별 예외 기준 설정 등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자추정제가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출발점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정교화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