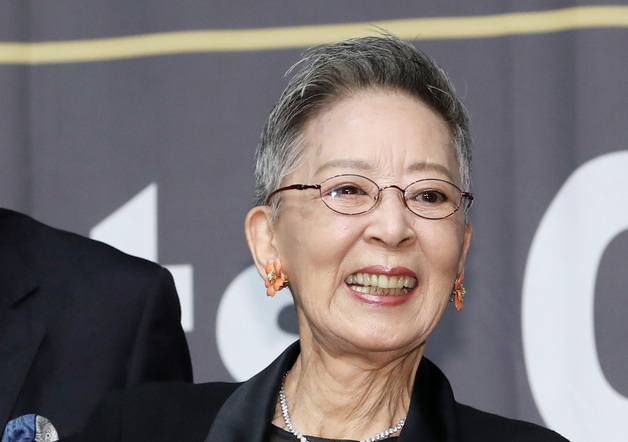가정돌봄 원한 호스피스 환자 8%만 자택서 임종…"권리 지킬 때"
국회입법조사처 "'내 집에서 생 마감할 권리' 보장 검토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가정 돌봄을 원했던 호스피스 이용 환자 중 약 8%만 실제로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돌봄을 선호한다고 답한 호스피스 환자 5086명 중 8.3%만 실제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지난 2021년 14%, 2022년 13.2%, 2023년 10.6%로 해마다 줄고 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등 임종기 환자들을 상대로 통증 관리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뉜다. 각 형태를 결합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021년 1만 9228명에서 지난해 2만 43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형 호스피스 사망 환자 중 301명 중 297명(98.6%)이 집에서 숨졌다. 가정형+자문형은 88.1%가 가정 돌봄을 원했지만, 사망자 중 54.5%만 자택에서 임종을 맞았다.
입원형+가정형도 72.5%가 가정 돌봄을 원했지만,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7.8%에 머물렀다.
자택임종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가정형 호스피스 등 제도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꼽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경북,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다.
재택의료 센터 등 임종기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도 부족해 병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노인 요양시설도 임종기 돌봄 기능이 약해, 입소자가 숨지기 직전에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자택에서 사망하면 변사 의심 상황으로 간주할 뿐더러 경찰 조사, 검안의의 사체 검안 등을 거쳐야 해 유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충격, 그리고 절차적 불편이 상당하다.
반면 영국과 일본 등 해외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자택임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임종 임박 환자의 선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예산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임종 서비스 수가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사처는 또 자택 임종을 준비하는 가족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사처는 "가족에게 전가되는 마지막 1~2주 집중 돌봄의 시간과 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미리 죽음을 얘기하고, 임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선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