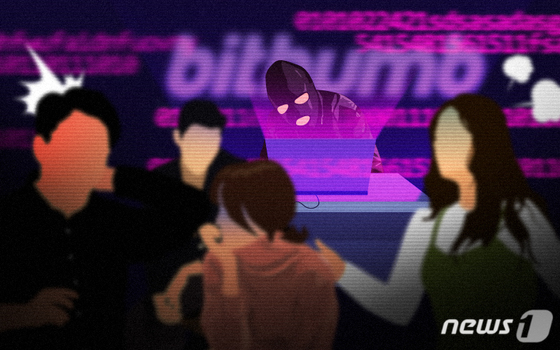'컨트롤타워 부재' 추친력 못 받는 K-바이오 정책…현장선 혼란 토로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로 나뉜 바이오산업 정책
부처마다 방향·속도 달라…현장선 "혼란스럽다" 목소리도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정책이 복수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와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여전히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 부처가 기초연구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따로 움직이는 칸막이형 행정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K-바이오 정책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책임을 나눠 맡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임상·보험급여를,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과제 관리, 산업부는 산업화·수출 지원을 담당한다. 문제는 부처별로 예산 구조와 사업 목적,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정책보고서에서 "혁신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 방향을 선명화하는 한편, 집행력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지원사업의 조건이 부처마다 다르고, 동일한 과제가 중복된다" "AI·의료데이터·디지털헬스 관련 규제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행정절차만 늘었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총리실 주재의 혁신위와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제한적이다.
혁신위는 올해 들어 8차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안건 대부분이 점검·보고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예산 조정이나 사업 승인 권한은 여전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복지부가 주무부처지만, 데이터 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산업부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불분명하다"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속도전이 늦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R&D부터 임상, 인허가, 상업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미국은 BARDA·ARPA-H, 일본은 AMED를 통해 각 단계의 예산과 인허가를 일원화해 속도전에서 앞서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R&D 예산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로 나뉘고, 임상 인허가는 식약처, 산업화 지원은 산업부로 분산돼 있어 전체 흐름이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정부 과제와 규제특례 제도가 중복되거나 지연되면서 글로벌 진입까지 평균 1.5~2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오업계에 수십년간 몸담아온 한 전문가는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세웠다고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선 여전히 리더십 공백이 있다"며 "조정이 아니라 조율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