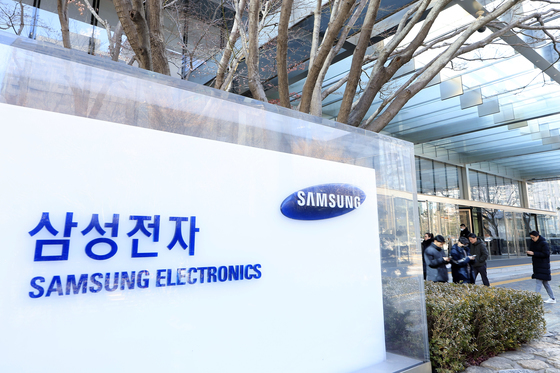日 잇단 노벨상 지금은 웃지만 향후 생각하면 한숨만
-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5~6일 연속으로 생리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나오면서 노벨상 수상자는 24명으로 늘었다. 21세기 들어서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16명이 배출됐다. 미국에 이어 2위다. 일본 학계뿐 아니라 국민들이 느낄 흥분과 자부심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다.
기생충 예방약 개발에 공헌한 업적으로 수상한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기타사토(北里)대 특별영예교수와 중성미자 진동 발견으로 상을 받은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도쿄대 교수의 연구 이력과 개인사 등은 일본의 기존 노벨상 수상 기록과 함께 대서 특필되고 있다.
일본 과학자들의 고집스러운 연구 태도와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몰두,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풍토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도 각 매체들에서 나온다.
하지만 환호성만 터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겹쳐 있다. 노벨상을 가능하게 한 공적은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실적에 근거하는데 당시와 이후 연구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 우려의 배경이다. 눈앞의 성과주의에 매몰돼 기초 연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타임스가 선정해 최근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일본 대학들의 순위 하락이 일본에 충격을 준 것은 최근 수년 간 이 같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톱100'에 10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톱200'에 속한 일본 대학은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었다. 또 도쿄대는 20위권에서 43위로, 교토대는 50위권에서 88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대학 순위 하락은 연구가 쇠퇴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는 미국(37만 8625건)이었으며 중국과 영국, 독일, 일본이 뒤를 이었다. 국제 잡지에 발표되는 논문수에서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 추월당했다.
교도통신은 노벨수상자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와 달리 현재 일본 대학의 연구 환경은 혹독하다고 전하면서, 국립대 운영비 교부금은 법인화(2004년) 이후 10년 동안 약 1300억엔이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또 신진 연구원 자리는 종신 고용이 아니라 계약직이 늘고 있어 연구 분야에 참여하는 젊은층이 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도 지난 1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 대학이 자유롭게 사용처를 결정하는 운영비 교부금은 법인화 이후 10년간 10% 이상 삭감됐고, 젊은 교원 자리는 3~5년 임기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험이나 연구예산이 깎이면서 경제 성장과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인력과 자금이 모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자극야기 다능성 획득(STAP) 세포' 조작 소동도 이 같은 성과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본학술회의의 오오니시 다카시(大西隆) 회장은 교도통신에 "전체 지원액이 줄다보니 연구에도 부담이 나온다. 노벨상 수상자의 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llday33@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