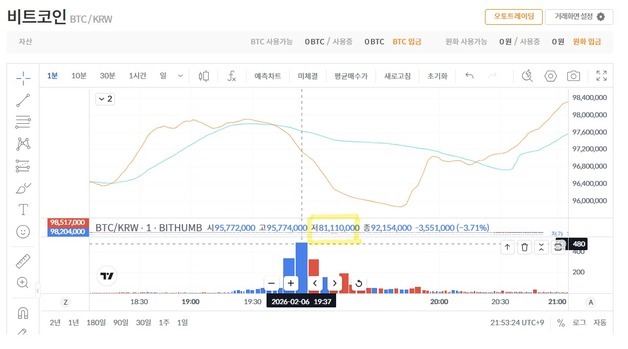[월드컵] 2002년 호나우두를 향하는 메시와 네이마르
나란히 4골 득점선두, 득점왕-우승 두 마리 토끼 조준
- 임성일 기자
(서울=뉴스1스포츠) 임성일 기자 = 자국의 조별예선 일정을 마친 두 선수는 공히 4골을 터뜨리면서 대회 득점선두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모두 조 1위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두 선수의 공이 컸다.
네이마르는 2경기서 멀티골을 성공시켰다. 자신의 월드컵 무대 데뷔전이던 크로아티아와의 개막전에서 2골을 뽑아내며 3-1 승리를 견인했고 카메룬과의 3차전에서도 역시 2골을 터뜨리며 4-1 대승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카메룬전에서는 가상의 축구 게임에서나 가능할 법한 묘기에 가까운 테크닉 과시하면서 찬사를 이끌었다.
메시도 명불허전이었다. 26일(한국시간) 끝난 나이지리아와의 최종전 2골을 포함해 3경기에서 모두 골맛을 봤다. 순도가 그만이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1차전에서는 1-1 상황에서 폭풍 같은 드리블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이란과의 2차전은 집중력이 빛났다. 질식수비에 내내 고전하던 메시는 후반 추가시간, 상대가 잠시잠깐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왼발 중거리포로 기어이 골문을 열었다. 나이지리아전에서는 프리킥 골도 나왔다. 과연 메시였다.
두 선수는 로빈 판 페르시와 아르연 로번(이상 네덜란드), 에네르 발렌시아(에콰도르), 카림 벤제마(프랑스), 토마스 뮐러(독일) 등 3골을 터뜨린 2위 그룹을 따돌리고 득점 선두에 올라 있다. 3경기서 4골. 최근 월드컵 득점왕들이 대부분 5~6골에서 결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유력한 골든부트 후보다.
월드컵에는 한동안 ‘마의 6골’ 장벽이 드리워져 있었다.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마리오 캠페스(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1982년 파울로 로시(이탈리아), 1986년 게리 리네커(잉글랜드), 1990년 살바토레 스킬라치(이탈리아)가 모두 6골로 최다 득점자가 됐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은 2명의 득점왕을 배출했는데 올레그 살렌코(러시아)와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불가리아)가 나란히 6골을 넣었다. 1998년 다보르 수케르(크로아티아)까지, 내로라하는 골잡이들이 모두 6골에서 멈췄다.
그 벽을 허문 이가 브라질의 ‘축구황제’ 호나우두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브라질 대표로 출전한 호나우두는 ‘매 경기 골을 넣겠다’는 호언장담과 함께 8골로 최고의 골잡이에 등극했다. 그러나 호나우두 이후로는 6골 넣는 이도 사라졌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득점왕은 텀블링 세리머니가 인상적인 ‘전차군단’의 미로슬라프 클로제였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역시 독일의 토마스 뮐러가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다. ‘가장 많은’이라 표현했으나 그들의 기록은 5골에 그쳤다. 5골 득점왕 시대가 열린 셈이다.
월드컵에서 5~6골을 넣기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인데, 메시와 네이마르라는 하늘이 내린 재능들은 살짝 비웃고 있다. 경기당 1골은 넣고 있으니 지금 페이스라면 16강에서 5골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두 팀 모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인데, 마지막 결승 무대까지 간다면 산술적 계산으로는 2002년 호나우두의 기록까지도 가능하다.
만약 메시 혹은 네이마르가 골든부트 트로피를 받는다면 1978년 캠페스와 2002년 호나우두를 잇는 남미 출신 득점왕 계보를 이을 수도 있다.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남미 국가들의 강세를 감안한다면,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lastunc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