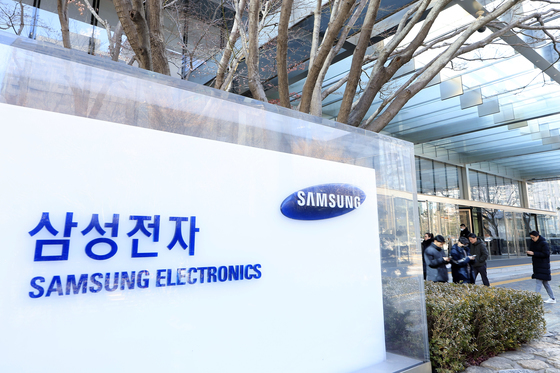[월드컵]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잊은 클린스만의 미국
가나 제압하고 죽음의 G조 다크호스 떠올라
- 임성일 기자
(서울=뉴스1스포츠) 임성일 기자 = 어떤 분야에서건 최고를 달리는 미국이지만 축구판에서는 그리 힘을 쓰지 못했다. 축구판의 헤게모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럽과 남미가 쥐고 있었고 미국은 북중미 내에서도 오래도록 멕시코에게 맹주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다 과거의 이야기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서서히 축구에 맛을 들였다. 1994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했다. 물론 국가적인 힘으로 유치했다는 외부의 볼멘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서서히 축구 실력으로 잡음을 없앴다. 어느 순간 멕시코를 넘어 북중미 최강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세계 축구계에도 명함을 내밀고 있다.
어느덧 월드컵 단골손님이 됐다. 미국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이번 브라질 대회까지 24년째 월드컵 개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북중미 예선도 16번 싸워 12승2무2패, 멕시코를 따돌리고 조 1위로 통과했다. 26골을 넣고 13실점을 내줬다는 내용도 준수하다. 본선에 확인했듯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북중미 국가들의 축구 수준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기록이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북중미 대륙의 축구 대항전인 골드컵에서도 파나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축구판에서도 제법 세를 과시하고 있는 미국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독일 축구의 전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있다.
1990년대 전차군단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것은 2011년 여름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끌며 지도력을 검증받은 클린스만은 잠시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거쳐 미국 땅을 넘어왔다. 클린스만은 그저 투박하기만 했던 미국 축구에 유럽식 축구를 가미하기 시작했다.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팀이 참가하지 않았던 1930년 1회 대회의 3위를 제외하고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것이 미국의 월드컵 최고 성적이다. 클린스만이라는,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축구인에게 지휘봉을 맡긴 것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어느 정도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앞서 언급했듯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 미국은 승승장구였다. 그런데 정작 본선 대진 운이 없었다.
미국이 속한 G조는 제대로 죽음의 조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독일이 있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티고 있는 포르투갈이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한국을 4-0으로 제압했던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도 있다. 이 속에 있는 미국이란 가장 작은 존재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미국은 17일(한국시간) 브라질 나타우의 에스타디오 다스 두 나스에서 열린 가나와의 G조 예선 1차전에서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경기 시작 29초 만에 터진 뎀프시의 대회 최단시간 골로 앞서 가던 미국은 후반 37분 가나의 앙드레 아유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승점 1점에 그치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존 부룩스가 헤딩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실속 있는 경기를 펼쳤다. 가나가 21번의 슈팅 속에서 1골에 그친 반면 미국은 8번 슈팅 중 2개를 골문 안으로 넣었다. 7개가 유효슈팅이었다. 실속 있는 운영과 함께 월드컵에서 2번 만나 모두 1-2로 패했던 가나에게 2-1로 복수했다.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보았듯이 가나의 전력은 만만치가 않다.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아프리카 최강으로 꼽히는 팀이다. 그런 가나를 상대로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펼친 미국은 확실히 강함이 엿보였다. 독일에게 0-4로 완패했던 포르투갈과 비교해도 미국의 전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2차전 상대는 클린스만의 조국인 독일이다. 독일을 워낙 잘 아는 클린스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승부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미국이 아니다.
lastunc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