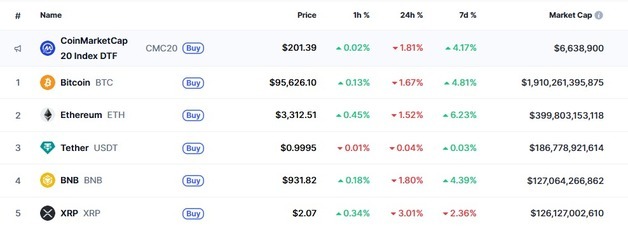'병든 거인', CCTV 사찰 등 진실 게임은 '산 넘어 산'
- 김지예 기자
(뉴스1스포츠) 김지예 기자 = '거인'이 나날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운데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대표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롯데는 6일 "최하진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권두조 수석코치를 비롯해 공필성 코치, 배재후 단장까지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왜 '거인'의 상처는 봉합되지 못할까. 한달 가까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난달 28일 선수단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곪은 상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서 5월 권두조 수석코치와의 소통 문제로 교체 요구를 관철시켰던 이들은 이번엔 이문한 운영부장이 부임 후 선수 및 코치들을 이간질했고, CCTV를 통해 선수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지난해 1월 롯데 구단 대표로 취임한 최하진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롯데 사태'는 또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월3일부터 6일까지 최하진 대표가 직접 파라다이스 호텔, 노보텔, 로얄 호텔, 스탠포드 호텔, 리베라 호텔 등 7개 호텔에 대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의 CCTV 녹화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지 확인했다. 유성호텔은 최 대표가 참석하진 않았지만 녹화 자료는 구했다"고 밝혔다.
또 "호텔 측이 롯데에 건네준 '원정 안전 대장'은 4월부터 6월까지 선수들이 머문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선수들의 외출, 귀가 시간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선수들이 경기와 훈련을 마친 뒤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마저도 감시 당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인권 침해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최하진 대표는 "선수단 관리 규정에 출입 통제를 어겼을 경우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었다"면서 "구단 프런트의 감시가 아닌 안전과 도난사고 방지 등 선수 보호 차원에서 호텔에 CCTV 자료를 요청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CCTV 감시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빈약한 근거로는 이미 일어난 거센 불길을 잠재울 수 없었다.
분개한 롯데 팬 150여명은 5일 저녁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 프런트 간부진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삭발도 불사했다.
확실히 선수를 보호하고자 CCTV 검열을 했다고 보기엔 방법과 정도가 지나쳤다. 게다가 롯데 선수단은 CCTV 감찰 사실을 일절 전해 듣지 못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18조 3항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를 비롯해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단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다.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 자료를 제3자 측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호텔 측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물론 최 대표의 설명을 따르면 호텔에 CCTV를 설치한 것은 25조 1항의 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는 5항 '영상정보 처리 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된다'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법 75조에 따라 25조 1항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구단의 대처도 여러모로 아쉽다.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상황에서 이종운 신임 감독 선임 등의 임시 방편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최하진 대표의 사임까지 불러온 구단 내 석연치 못한 일처리까지 드러나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무너져 내리는 '거인'이 다시 우뚝 서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듯 하다.
hyillil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