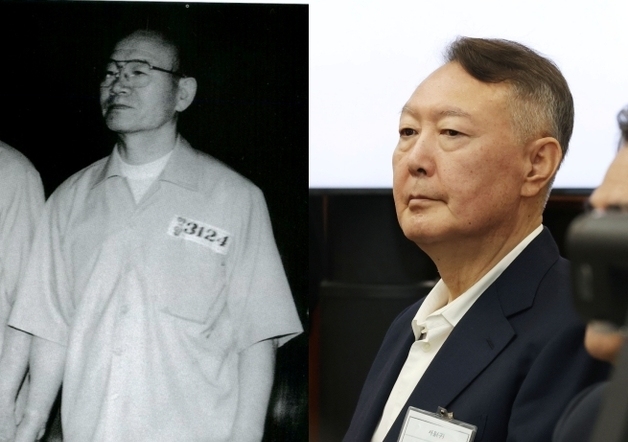ITZY 유나가 알려준 택배 재활용법…이재명 정부, 그다음을 본다 [황덕현의 기후 한 편]
분리배출 교육·인식개선 노력 '인상적'…다음 단계 '덜 쓰는 것'
기후장관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줄여야"…대체재만 정답 아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도시락을 만든다.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테이프와 배송장을 먼저 뗀다. 우유갑과 멸균팩은 씻어 말린 뒤 일반 폐지가 아닌 종이팩 전용 수거함으로 향한다. 흔한 영상 일기, 이른바 브이로그는 아니다. 4세대 아이돌 ‘경국지색’으로 불리는 장원영·카리나·설윤·유나 가운데 한 명, JYP엔터테인먼트 ITZY의 유나(22·신유나)가 출연한 한국제지연합회 영상이다.
유나는 최근 한국제지연합회의 콘텐츠 'RE:PAPER 100'에 참여했다. 종이로 100% 살아보기를 표방한 이 영상에서 유나는 플라스틱과 비닐 대신 종이만으로 일상을 꾸린다. 종이 도마와 종이 용기로 도시락을 만들고, 신문지를 접어 장바구니를 만든다. 종이는 나무를 베기만 하는 산업이 아니라 조림지와 순환림을 통해 관리되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종이는 플라스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유나는 종이 분리배출법을 직접 설명한다. 택배 상자는 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짚는다. 우유갑과 멸균팩은 일반 폐지와 섞지 말고 내용물을 씻어 말린 뒤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코팅된 전단지나 영수증, 음식물이 묻은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종이를 쓰자는 캠페인이지만, 아무 종이나 친환경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이 영상이 겨냥한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종이를 '올바르게 쓰고, 제대로 버리면 괜찮은 대안'으로 먼저 자리 잡게 하려는 시도다. 4세대 아이돌의 비주얼과 친근한 연출은 종이를 선택하는 행위를 불편한 절제가 아닌 일상의 선택처럼 보이게 만든다. 종이를 쓰고, 잘 버리면 된다는 메시지가 녹아있다.
다만 국가 정책 방향은 제지연합회의 의도보다 벌써 한걸음 앞에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핵심은 재질 경쟁이 아니다. 플라스틱 컵이든 종이컵이든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비용을 붙여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매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편 가르기'가 아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보다, 얼마나 쓰고 있느냐로 향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규제는 늘 대체재를 찾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플라스틱이 문제면 종이, 종이가 문제면 생분해성 소재가 해법처럼 제시됐다. 그러나 대체재가 바뀌는 동안 일회용 소비의 총량은 줄지 않았다. 종이컵 사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원 소비가 줄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지 산업 역시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지 않다.
기후부가 꺼내든 '한국형 에코디자인'이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이다. 재질을 바꾸는 경쟁이 아니라,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흐름에서는 종이와 플라스틱의 구분이 점점 의미를 잃는다. 일회용이라는 공통점이 더 중요해진다.
제지연합회의 영상은 분리배출 교육과 인식 개선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최현수 제지연합회장(깨끗한나라 회장)의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정책 환경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질문은 종이를 얼마나 잘 버릴 수 있느냐가 아니다. 종이를 포함해, 얼마나 덜 쓰게 만들 수 있느냐다.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그 질문 앞에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