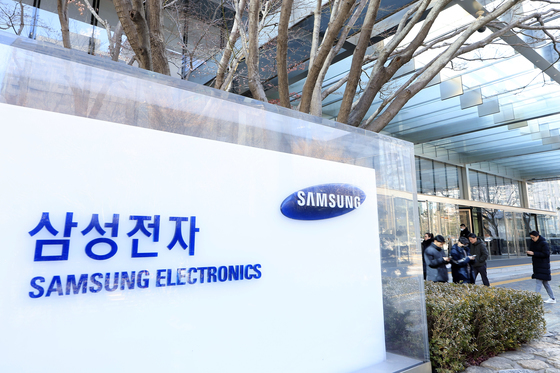"의원 끌어내라" 두고 尹 탄핵심판 진실공방…곽종근 증언 파고든 尹
'계엄군 투입' 곽종근, 일부 증언 불분명…정형식 "진술 달라져"
'직접 지시' 탄핵 판단 중대 사유…이상민·조지호 등 진술 주목
- 황두현 기자, 김민재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두고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국회의원'은 이해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의원) 150명'이라는 숫자는 사후 기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일부 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지는데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이뤄졌다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한 위헌적인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행위로 중대한 탄핵심판 판단 요소다.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며, 대상은 정황상 '국회의원'"으로 정리된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 지시한 대상이 의사당 안 국회의원들이 맞냐'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 이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오전 12시 20분경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들었는데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도 '보좌관과 수천 명의 시민 중 사람이 의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아니다.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곽 전 사령관은 "왼쪽에 티브이(TV)가 있어 화면에서 국회 본회의장 의장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 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고 한 부분"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의원) 150명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자신의 명확한 기억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150명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떠올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이 끝나자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를 막아라.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게)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이야기냐"고 직접 반박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수 차례 검증한 것은 증인 진술이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판단에 직접적 증거(스모킹건)가 될 수 있어서다.
국회 내 계엄군 투입 행위는 방송 중계 등으로 명확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시 내역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에 제출된 군과 검찰 수사기록은 증거 채택 여부를 양측이 다투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증명되면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의원 150명은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반대한 셈이 된다.
헌법(77조)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의 정치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나 법원(사법)에 대한 조치만 가능하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이날 윤 대통령 지시를 두고 불분명하게 비칠 수 있는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곽 전 사령관에 "신문에서 말하는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며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이런 게 혼재돼 있다"고 짚었다. 재판장인 문형배 재판관은 진술 조서를 다시 읽고 답할 시간을 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직후 직접 연락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지난 4일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두고 증언이 엇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소통한 인물들이 내놓을 증언이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오는 11일과 13일 열린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