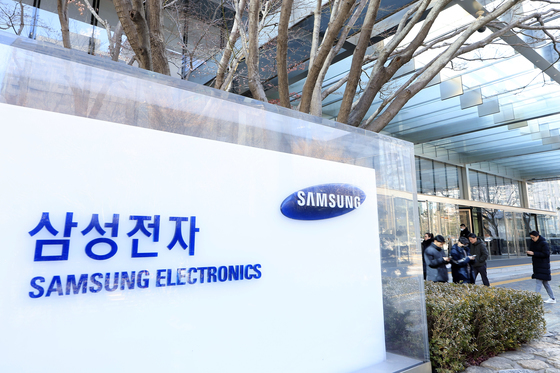"수사기관 '포토라인', 공인기준 등 세부준칙 필요"(종합)
법조·언론 공동 토론회…'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알권리 충족" vs "공인이라도 인격권 침해 안돼"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를 취재진 앞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일명 '포토라인' 관행의 인격침해 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언론계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법조인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됐다.
좌장으로 나선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양승태 전 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고 언론들이 '포토라인 패싱' 이라고 보도했다"며 "포토라인이 확고한 제도로서 정착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은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속성이 있다"며 "토론회에서는 이 포토라인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개선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영국 공영방송 BBC와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의 보도강령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IPSO는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적이나 공적 장소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의 필요성은 지금도 있다고 본다"며 "포토라인이 없어지면 현장은 영상 취재진 등이 몰려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말이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긴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는 "공인은 일반인보다 인격권이 더 침해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공인의 범위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되돌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인의 경우 적극적 거부 표시가 있어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인의 개념과 포토라인 동의 확인 방식을 두고 검경, 언론, 학계 등이 모여 세분화한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언론사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이 협의해서 언론사에 대해 추가적 징계를 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서는 소환장소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토라인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의 포토라인 동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 알권리와 무죄추정 원칙 사이에서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유인물로 된 축사를 통해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수사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가 좌장,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yj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