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막는다지만…건설사, 강화된 처벌에 '사업 축소' 고민
[처벌만으론 부족]➀ 초강도 제재, 대형사·중견사 모두 부담
"현장 규모별 차등 기준 필요…산업 외형 축소 우려"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내세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등록 말소와 과징금 등 초강도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의 사업성을 흔들고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한국 건설업계의 오랜 문제다. 지난해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률은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 여전히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기조로 거듭 경고했지만, 대형 건설사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강력한 처벌 중심의 해법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제재다.
아울러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최소 30억 원 이상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사망자가 4명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200억 원에 과징금 60억 원이 부과된다.
국회에는 더 강력한 법안도 대기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상한액 10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업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공사를 진행해도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매출 9조 2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 3% 적용 시 상한 100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되면 영업이익 1200억 원의 83.3%가 소진된다. 매출 10조 5036억 원인 대우건설도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되면 순이익 2428억 원의 절반이 줄어든다.
중소·중견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계룡건설(매출 3조 1694억 원)의 경우, 과징금 950억 원 적용 시 순손실 405억 원이 발생하며, 두산건설(매출 2조 1753억 원)은 과징금 652억 원으로 순손실 454억 원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부안과 국회안은 별도 법안이므로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중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헌법 정신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 법 제·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수에 따른 제재도 논란이 크다. 지난해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연간 사망자 3명을 넘어, 정부 대책대로라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가 대상이다.
대우건설은 사망자 7명으로, 과징금 3151억 원이 부과돼 당기순손실 723억 원으로 돌아서는 구조가 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단순 사망자 수 중심의 제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형사는 현장이 많고 기술 난도가 높은 공사가 많아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자 수만으로 제재하면 사실상 대형사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췄고, 대우건설도 105개 현장이 중단됐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사고 발생 시 벌칙은 필요하지만, 최종 사망자 수로 제재를 결정하면 현장이 많은 대형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안전관리 강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수주 위축과 사업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형사든 중소사든, 외형 축소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방어적 경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등록 말소 같은 극단적 제재는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현재는 사고 원인이 아닌 사망자 수로 제재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건설 산업 외형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벌칙을 주는 방향은 맞지만, 최종 사망자수로 제재를 결정할 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현장이 많아 사고율이 높은데 사망자수로만 따지게 되면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안전관리 강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수주 위축과 사업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형사든 중소사든, 외형 축소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방어적 경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등록 말소 같은 극단적 제재는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현재는 사고 원인이 아닌 사망자 수로 제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건설 산업 외형 축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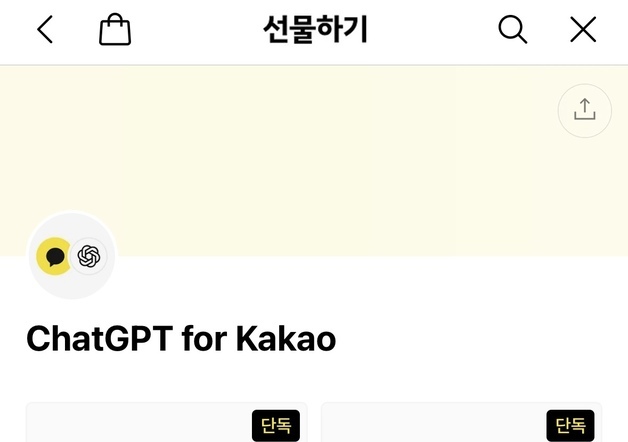






편집자주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에 초강도 제재를 예고하면서 산업 전반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 그리고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짚어본다.